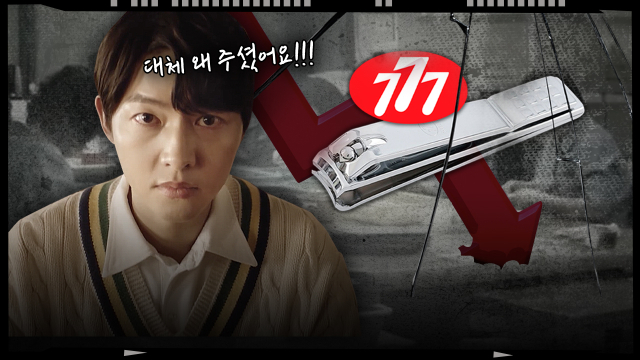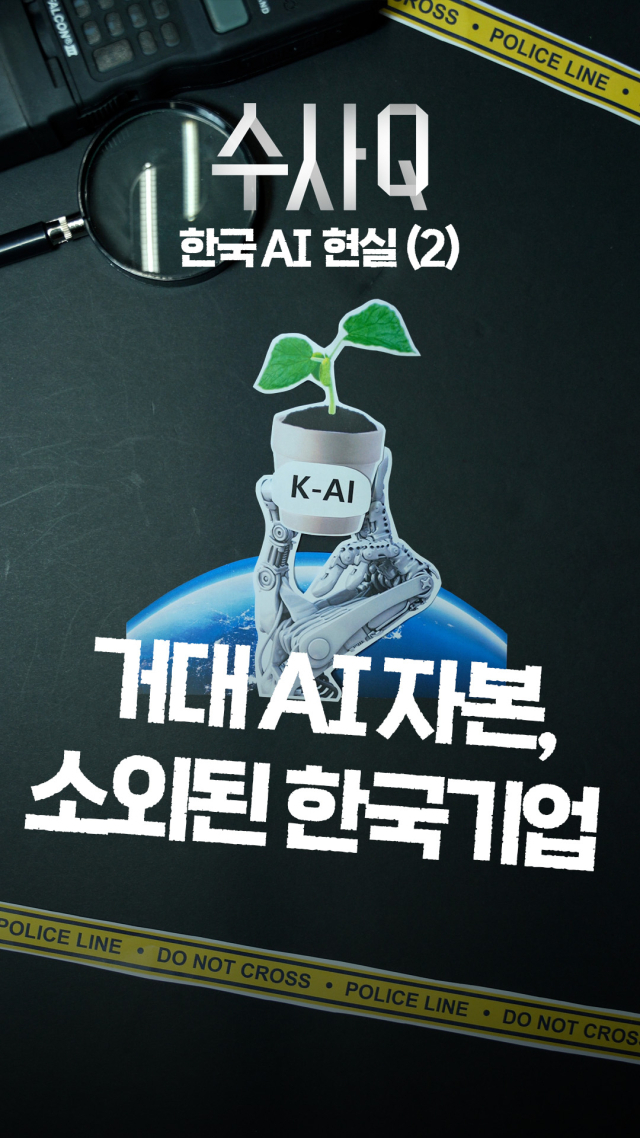“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선점 타이밍을 놓쳤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1·2·3차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 개척으로 이를 만회해야 합니다.”
전삼현(사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일 서울 북창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성장형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사전규제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막는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에 태생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신성장 분야의 창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애플·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미국과 알리바바의 중국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 밀려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 역시 지난 10년간 약 120조원의 정부 예산 투입에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4차·6차산업에서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19대 대선주자는 4차·6차 산업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할 정책을 수립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 가르기식 시장배분형 경제민주화 정책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성장형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이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도 금융산업 혁명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마트쇼핑·스마트홈·스마트카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경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금산 분리와 영역별 방화벽으로 나뉘던 금융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유럽 핀테크 기업의 50%가 집중돼 있는 영국이 지난 2008년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채택한 뒤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지난 5년간 연 74% 고속 성장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은행 설립 규제 완화, 계좌이동제 실시, 국유 대형 은행 분할 등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정책이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며 “혁신과 경쟁, 규제 프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광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농업 기반의 6차 산업을 제대로 시행하면 향후 국가 안보의 중요한 지킴 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식 경제민주화와 분배식 경제민주화로 나눈 이분법적 사고는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국가의 미래와 젊은이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경제 및 사회 대통합을 염두에 둔 새로운 비전 정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