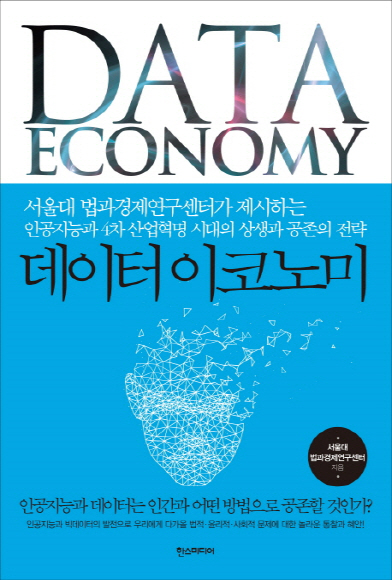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다. 벤츠, BMW, 토요타, GM 등은 물론 한국의 현대자동차까지 경쟁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마트폰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IT기업까지 가세해 구글이 그 선두에 있으며 애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랩스가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실생활에서는 당장 올 가을부터 광화문과 판교에서 무인 셔틀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안전성과 효율성이라는 자율주행차의 강점 이면에는 딱 그만큼의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종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책임 배분이 궁극적으로 법관의 판결에 의해 사후적으로 이뤄졌지만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고 이에 맞춰 미리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판단의 시점이 사후에서 사전으로, 판단의 주체가 법관에서 프로그래머로 이동”하게 되며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문제가 자동차 제조사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 만약 자율주행차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관리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나 해당 지자체, 소프트웨어 설계자나 공급자도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렵다. 자율주행차의 핑크빛 미래를 위해 규제는 가급적 완화하고 혁신을 위한 지원은 늘려야 한다지만 책임주체와 책임 배분은 더욱 복잡해질 따름이다.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의 필진 10명이 함께 쓴 ‘데이터 이코노미’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첨단 기술의 실제 적용과 이것이 초래하는 문제 및 대안을 이야기한다. 기술 발달의 속도를 법체제가 따라잡지 못하는 게 현실인지라 실정법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다각도로 사안들을 들여다보면서 현시점의 우리나라 상황에 주목해 해법을 모색한 점이 눈에 띈다. 편리한 미래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귀찮은 고민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표제에서도 강조된 ‘데이터’의 경우 미래의 핵심 자원이라 불릴 정도로 활용의 가능성이 크지만 빅데이터 중 유용한 것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 많아 제약이 따른다. 법률상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하는 만큼 더 이상 식별되지 않는 정보로 만들기 위한 변환이나 제거 등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라는 새로운 유형의 비식별화된 정보를 법에 명시했다. 미국에서는 보건 의료분야를 규율하는 법에서 ‘프라이버시 규칙’에 관한 비식별화 규정이 명시돼 실무에서 이용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와 액티브엑스컨트롤 등 온라인 거래시장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편하지 않은 간편 결제’의 문제도 발생한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른 결제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는 급격한 시장 구조의 변화를 예고한다.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유의미한 정보는 사용자의 행태에 기반을 둔 각종 정보인데, 여기서 결제정보는 소비경향을 예측하는 ‘화룡점정’ 격이다. 이미 상거래나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 우위를 차지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결제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것이나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에 투자하는 것도 모두가 한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지급 결제 플랫폼을 선점해야 한다”는 욕구에서 나온다. 1만6,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