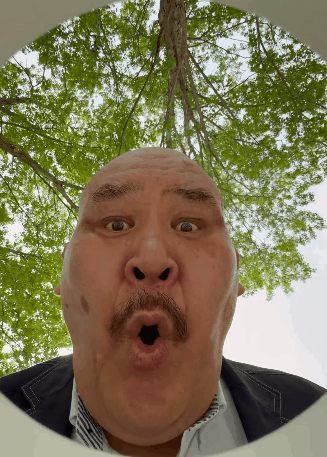2005년 8월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트라우마(외상후증후군)다. 플로리다 동쪽에서 발생해 캐나다 동부에서 소멸하기까지 13일 동안의 허리케인 대응 과정에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과 취약한 사회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후유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스의 ‘프렌치 쿼터’ 등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당시 물이 찬 지점을 하얀 페인트로 표시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
멕시코만에서 최고 등급(5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카트리나는 8월29일 루이지애나 삼각주에 도착하면서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왔다. 하루 만에 뉴올리언스 폰차트레인호수의 제방이 붕괴되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다. 미시시피강 하구의 저지대에 세워진 이 도시는 계속된 제방 쌓기와 간척 사업으로 80%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아져 카트리나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여기다 수만 명의 이재민을 수용한 슈퍼돔과 뉴올리언스 컨벤션센터에서는 전기가 끊기고 식수 공급과 환기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수용시설과 폐허가 된 시가지에서 약탈·총격전·방화·강간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났고 이재민의 대부분인 흑인들까지 가세한 인종·계층 갈등으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군 병력까지 투입되기도 했다.
카트리나 충격을 겪은 미국 지식사회는 이후 영화·소설 등에서 사회 고발의 단골 소재로 삼는다. ‘말콤X’ 등으로 유명한 뉴욕 출신 흑인감독 스파이크 리는 이를 영화로 기록한다. 2007년 나온 영화 ‘제방이 무너졌을 때(When the levees broke)’다. 뉴올리언스를 상징하는 재즈 선율이 애잔하게 흐르면서 재난 전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해 미국 사회의 무관심을 신랄하게 고발했다.
정확히 12년 만에 텍사스주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가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비구름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벌써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조현장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고 주 방위군까지 구조 활동에 나선다고 하지만 피해 정도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미국 사회가 카트리나 당시의 뼈아픈 교훈을 살려 이번 재난을 무사히 극복하기를 기원한다. /온종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