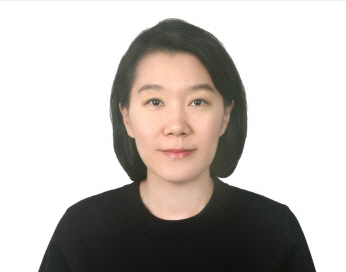호주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애들레이드 북부에 있는 작은 교외 도시 엘리자베스에서 15일 오전 진풍경이 벌어졌다. 1948년산 48-215 세단을 필두로 1,000여대에 달하는 호주 자동차 홀덴의 역대 차량들이 10㎞에 달하는 거리를 따라 퍼레이드에 나선 것이다.
‘홀덴 드림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라지는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홀덴의 최후를 장식하는 고별 무대이자 추모식이었다. 1856년 지역의 작은 마구류 제조회사로 출발해 1931년 미 제너럴모터스(GM)에 인수된 홀덴(GM홀덴)은 지난 1948년 호주 최초의 완성차 생산 업체로 자리매김하며 호주 제조업의 자존심을 살려온 브랜드다. 실상은 GM의 호주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지만 홀덴은 늘 호주인들이 사랑하는 국민차 메이커이자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징으로 인식돼왔다. ‘축구·미트파이·캥거루, 그리고 홀덴 차’라는 1970년대에 전개된 광고 캠페인 문구는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고는 한다.
그 홀덴이 오는 20일 엘리자베스 공장에서 마지막 코모도어 세단을 내보내는 것을 끝으로 호주 땅에서의 차량 생산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리고 홀덴 코모도어를 끝으로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설계·생산하는 13개국에 이름을 올려온 호주의 자동차 제조 역사도 막을 내린다.
연간 120만대 이상의 차가 판매되는 호주에서는 한때 일본 도요타와 미쓰비시, 포드, GM의 홀덴 등 4개 업체의 차량이 생산됐지만 2012년 미쓰비시가 일찌감치 발을 뺀 데 이어 지난 1년 사이 나머지 업체들도 줄줄이 공장 문을 닫았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빅토리아주 멜버른 인근에 1963년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로 설립한 유서 깊은 앨토나 공장은 3일 가동을 공식 중단했고 포드차는 이보다 한발 앞서 지난해 10월 호주 진출 91년 만에 공장을 철수했다.
사실 호주 자동차산업의 허망한 몰락 스토리는 지난 수년 동안 국내외 언론에서 다양한 각도로 심심치 않게 소개돼왔다. 한 나라에서 특정 산업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니 말이다.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호주 통화가치 급등과 인구 2,300만명에 불과한 빈약한 내수시장, 지리적 취약점, 위험 회피형 기업 문화 등이 단골 레퍼토리로 지적됐고 2013년 정권을 잡은 보수연합 정권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금 삭감 결정은 생산 라인 철수를 불가피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으로 질타를 받았다. 맬컴 턴불 총리를 비롯한 집권 보수 자유당 측은 더 이상 혈세로 자동차 공장을 돌릴 수 없다며 호주산 자동차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은 달라진 소비자 취향 때문이지 정부 정책의 실패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경쟁국에 비해 높은 인건비 부담과 경직된 노동 시장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호주 정부는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넉넉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 덕에 근로자들의 임금은 연일 치솟았다. 기업들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태국 등지에서 수입차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호주산 자동차는 정부 지원 없이 버틸 재간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점에서 호주 자동차산업의 붕괴는 정부와 기업, 노조 모두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호주 자동차산업의 붕괴에 대한 해묵은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지금 한국의 제조업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날로 치솟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빈발하는 파업 부담,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새 정부의 정책들 속에 GM대우 철수설이 심심치 않게 나도는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쟁력의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물론 호주와 한국의 상황이 같다고는 할 수 없다. 공연한 비관론을 제기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제조업 본국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한미 FTA 재협상이 공식화되는 등 대외 경쟁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지금 호주의 지난 발자취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이 취약해진 호주에는 그나마 자연이 준 풍부한 자원과 농축산업이 있다. 한국에서 제조업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 kls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