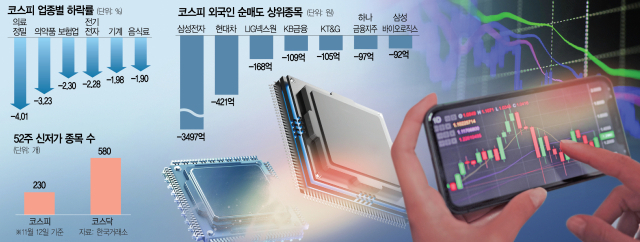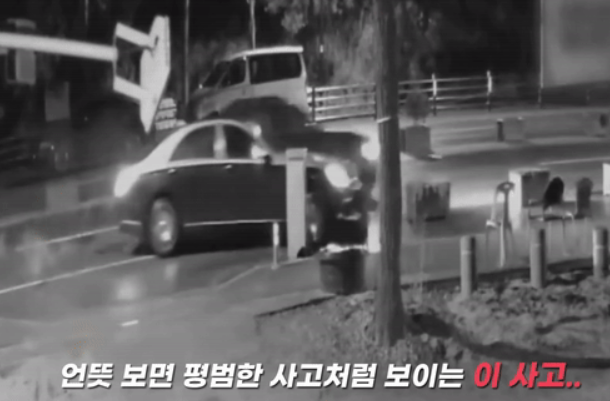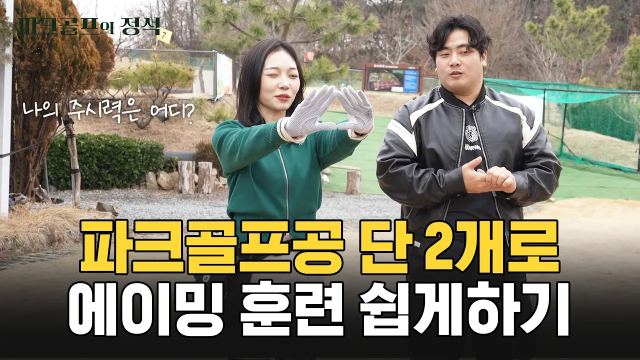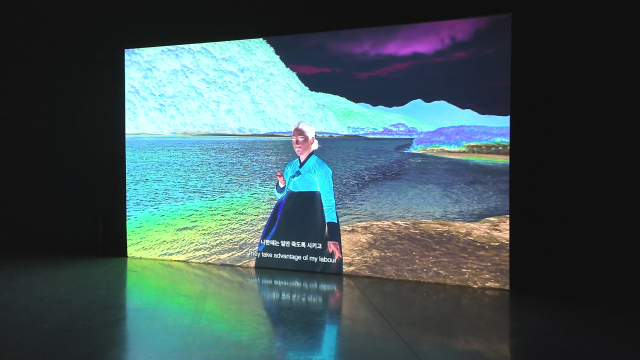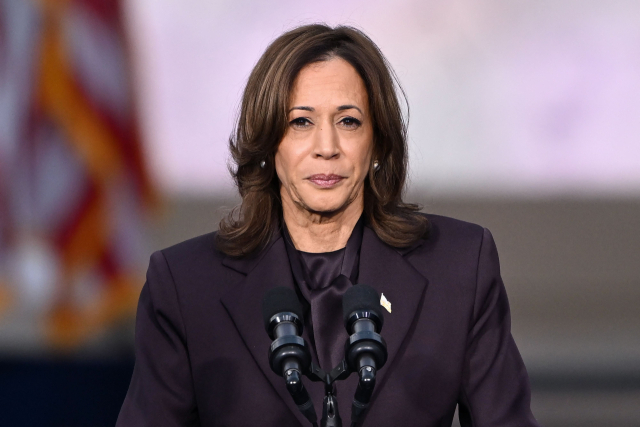대기오염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해 현재 약 7%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과 입지규제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이 뒷받침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을 융복합한 에너지 플랫폼 구축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하면 설비의 최적 설계와 설치에 대한 사업자 지원이 가능하다. 미국 구글의 선루프 프로젝트와 제너럴일렉트릭(GE)의 디지털윈드팜을 예로 들 수 있다. 구글은 지난 2015년부터 일사량 데이터와 구글지도상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정의 태양광설비 설치 효과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E는 풍력발전기에 센서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모델을 개발해 실제 건설될 발전소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설계와 설비 운영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ICT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후 효율적인 설비운영·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빅데이터, 드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최근 KT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과 분석, 최적의 설비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빅테이터 분석 엔진인 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평균 61%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15%의 발전량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비효율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VPP) 역시 ICT를 활용한 신산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VPP는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분산된 에너지 전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근 테슬라가 호주에 최소 5만가구 규모로 태양광 설비와 배터리·스마트미터(전자식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VPP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인 피클로의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VPP·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플랫폼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개시장의 활성화와 자유롭고 유연한 전력시장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에도 ICT를 활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전력망을 연계해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분산전원을 네트워크로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해 발전량을 분석하고 예측·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전력망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간헐성과 변동성을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은 대규모 지진의 영향으로 스마트 전력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2024년까지 모든 가구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인프라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IT와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와 ICT 융복합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때다. 하나의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를 넘어 여러 기술이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