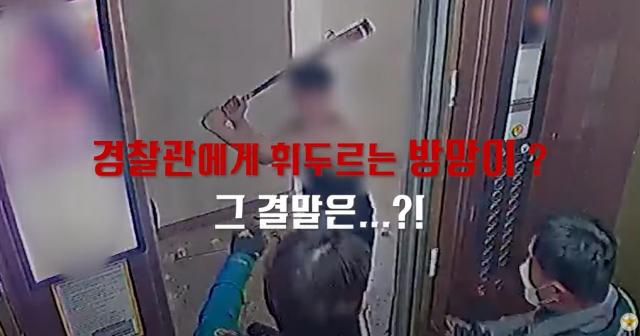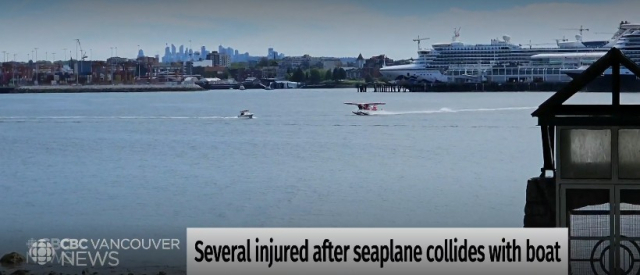이 같은 셰프의 인기는 당장 지상파나 케이블TV 프로그램은 물론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로 성장한 유튜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청률 높은 콘텐츠를 살펴보면 어김없이 셰프가 등장한다. 심지어 오지 체험방송이든 한가로운 토크쇼든 유명 셰프가 등장하면 단숨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이처럼 화려하게만 보이는 셰프의 세계지만 그들의 숨겨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TV 속 화려함의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에 베이고 뜨거운 불에 데는 거친 주방 속 피땀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특히 모든 셰프들의 꿈인 ‘미쉐린 스타’의 별을 따기 위해서는 설거지나 청소 같은 궂은일부터 시작해 최소 10년간 한눈팔지 말고 요리에만 매달려야 겨우 문턱에 다다를 수 있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각오 없이 단순한 동경심으로 뛰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셰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해외에 비해 아직 크지 않은 시장규모라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프랑스나 미국처럼 ‘파인다이닝(고급 레스토랑)’ 시장이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한국에서 요리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는 어렵다. 일부 미식가들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과시하듯이 소비될 뿐 파인다이닝 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셰프들은 매년 발표되는 ‘미쉐린 스타’ 같은 떠들썩한 타이틀에만 집착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에는 국내 레스토랑의 ‘미쉐린 스타’ 선정을 앞두고 심사 공정성 논란까지 일며 업계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셰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망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정년퇴직 후 치킨집을 여는 것은 말리지만 전직 외교관이라도 셰프 타이틀을 달고 일식집을 차리면 부러워하는 시대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요리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얘기도 아닌 세상이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나 대학들이 미래의 셰프를 꿈꾸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요리대회도 점차 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셰프를 활용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호텔·유통 업계는 쿠킹클래스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고 식품 업계 역시 유명 셰프들을 앞세운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대거 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