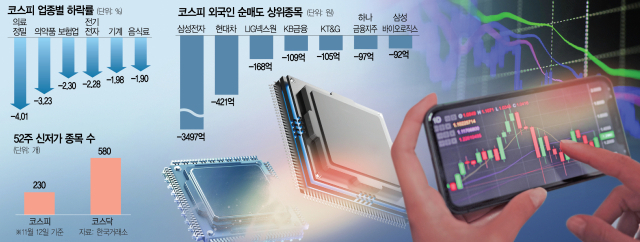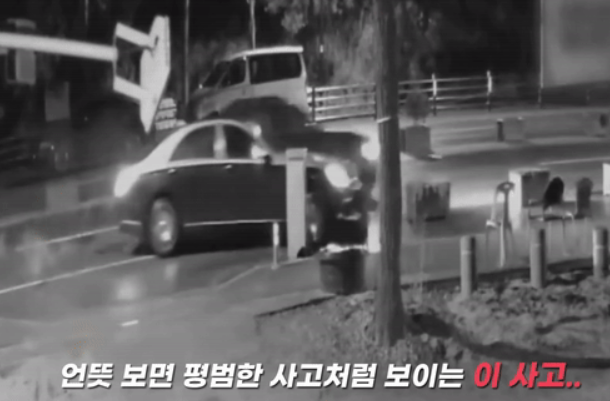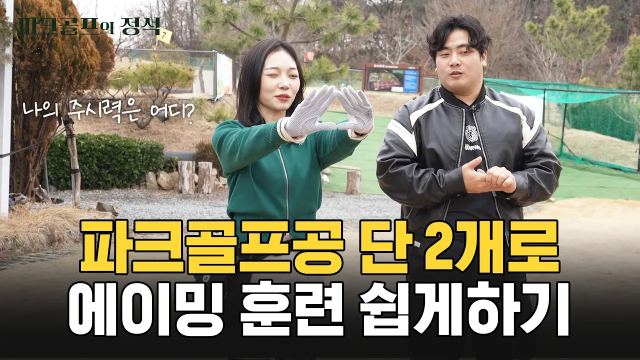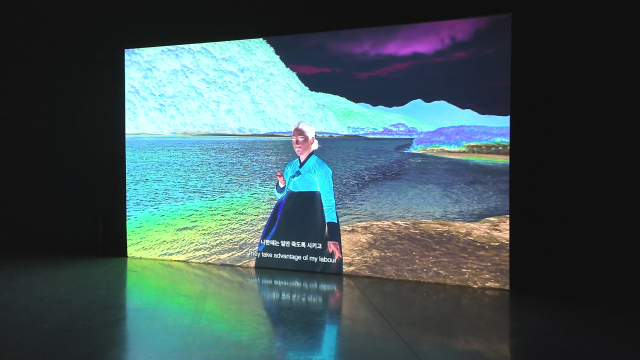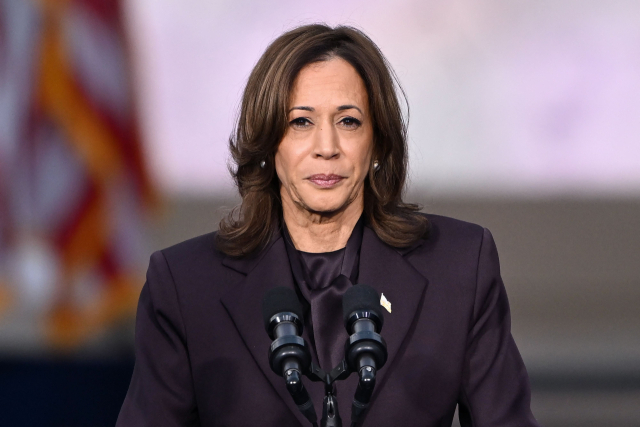스타트업 A사는 고객이 셀카 이미지를 올리면 이를 분석해 인공지능(AI)이 맞춤형 안경테를 추천하는 안면인식 서비스를 개발했다. 하지만 A사는 이 서비스의 국내 출시를 접었다. 얼굴 이미지 분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 다행히 중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 결과 A사의 중국 진출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A사 사례는 포지티브 규제가 어떻게 신산업을 옥죄는지 잘 보여준다.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가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도 그런 사례에 속한다. 국내는 현행법상 체지방·탈모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만 허용하다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했다. 반면 영국·중국 등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련 창업은 아예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도심형 숙박 공유업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 법으로 일일이 나열해 허용, 외국인만 이용 가능하다. 22일 대한상의는 이런 포지티브 규제를 비롯해 기득권 저항, 소극적인 행정 등이 국내 신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덫이라고 지목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신산업 진입 규제는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높았다. 상의의 신산업 분야 대표 규제 사례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은 조사 대상 54개국 중 38위였다. 한국(4.19점)은 미국(5.27점), 일본(4.94점), 중국(4.90점)은 물론 이집트(4.86점)보다도 규제가 많아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기득권 저항도 문제로 꼽힌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이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 분야의 경우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시범사업 시행만 십수년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의 반발이 심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개혁 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무원의 졸속·소극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규제를 풀면 부처 권한이 약해진다는 공무원 인식이나 공무원 사회의 보신행정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가령 업체 대표가 이공계 전공자 아니라는 이유로 벤처기업 인증에 탈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종 허가를 지역 민원을 이유로 해주지 않아 낭패를 본 사례도 있었다. 정영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기득권과 포지티브 규제, 소극 행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 혁신을 규제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사 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했지만 경쟁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