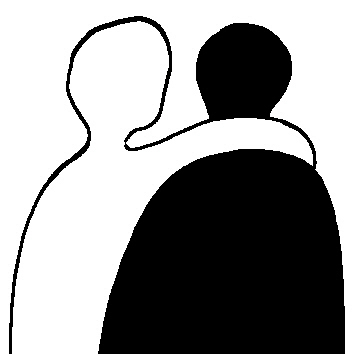작가 김혼비는 ‘아무튼, 술’이라는 매혹적인 책에서 술 한잔을 나누며 만난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하여 맛깔나는 이야기상을 차려낸다. 취중에 전철을 탔는데 어쩌다 보니 ‘충청도’까지 와버렸고, 혼돈 속에 정신을 붙들어보니 ‘충정로’역이더라는 옆구리 푹 찌르는 생활유머 사이로, 오랜 술친구의 취중진담 같은 고백이 뚝뚝 묻어난다. 내가 안 괜찮은지도 모르고 매일 술을 마시던 시절, 휘청거리는 내게 꼭 필요했던 ‘힘내’라는 말, 그리고 그 한마디가 불러온 작은 기적에 대해서도.
이제 ‘힘내’라는 말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는 이렇게 썼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힘을 내야만 하니까.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은, 결국 살자는 이야기다. 맥 빠지고 막막한 와중에도, 아무튼 계속 살아보자는 것이다. ‘힘내’라는 말이 부끄럽고 멋쩍어서 나는 말하는 데도 듣는 데도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다. ‘힘내’라는 말은 그저 무책임하고 무력한 문장만은 아님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은 살아낼 거라고 믿어주는 누군가의 짧고 강력한 기도임을. /이연실 문학동네 편집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