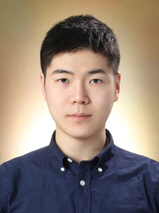15억4,000만원. 지난해 신한금융투자에서 임 모 전 본부장이 받아간 연봉이다.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신한금투 대표는 물론이고 신한금융그룹 수장인 조용병 회장(12억6,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그해 신한금투의 ‘연봉왕’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구속기소 돼 있다. 그는 라임 펀드 환매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거론되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해외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한금투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신한금투는 “상여금 대다수는 2019년 이전에 이연된 것이고 라임 이슈가 불거진 이후엔 상여를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후’에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도덕적 측면에서 의혹이 있던 인물에게 사내 최고 연봉을 주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한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는 임 전 본부장이 무죄로 판결난다고 해도 변함이 없다.
임 전 본부장 사례를 계기로 국내 증권사들이 무작정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해왔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간 증권가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능력’에 비례해 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계로 여겨져 왔다. 모회사 ‘회장님’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손에 쥐는 차·부장들이 매년 등장하고는 했다.
‘연봉왕’은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를 가장 잘 대표해주는 타이틀이다. 하지만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람에게 그 왕관이 씌워졌다는 사실은, 역으로 능력주의가 ‘성과만능주의’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반추하게 한다. 또한 이 때문에 국내 증권인들의 땀과 성과가 폄하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앞선다. 아무쪼록 증권업계가 이번 사례를 ‘성과’와 ‘도덕성’을 두루 다루는 논공행상의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