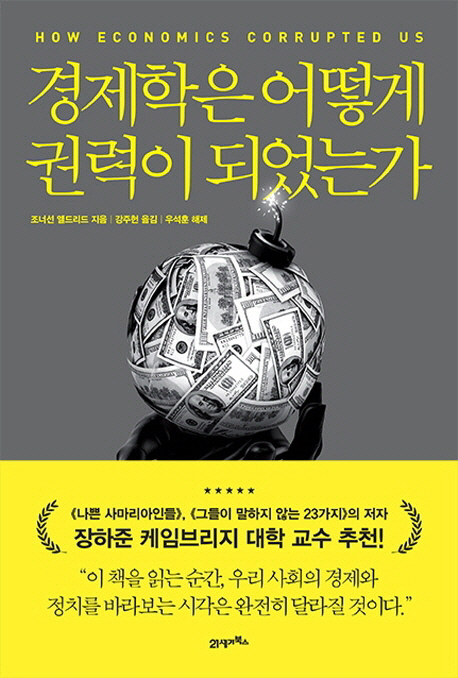‘5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며 우리의 생각은 타락해 왔다.’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스며들어 일상을 지배해 온 그 규범이란 ‘호모 에코노미쿠스(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판단·행동하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현대 경제이론들이다. 경제학자인 저자는 이미 우리 일상에 침투한 대표 경제이론들의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치며 주류 경제학에 통쾌한 한 방을 날린다.
첫 과녁은 ‘죄수의 딜레마’로 유명한 게임이론이다. 각각 다른 방에 있는 범인 둘에게 ‘당신과 동료가 공범임을 자백하면 당신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하면 이들은 ‘상대가 자백하면 나만 피해 본다’는 생각에 자신의 이익만 고려한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이론은 ‘합리적인 인간은 비협력적이고 서로 믿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가정대로라면 기업은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재화의 가격을 낮추기만 할 것이고, 스포츠 경기장에선 모든 관중이 경기를 더 잘 보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기업은 ‘제 살을 깎아먹기’를 피하기 위해 가격인하 경쟁의 유혹에 저항하고, 같은 이유에서 경기장의 관중들은 자리에 앉아 응원한다. 국가 간 탄소배출 억제, 공유 자원 관리 등도 같은 맥락이다. 저자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대한 게임 이론의 조언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 바보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 뿐”이라고 꼬집는다.
경제학적 무임승차 개념도 정면 겨냥한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집단)들의 기여에 힘입어 이득을 얻는 무임승차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깔고 있다. 당신 몫을 하든 말든 달라지는 게 없다면 쓸데없는 희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무임승차는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책은 이를 반박하는 인간 행동을 제시하며 이 이론이 지닌 위험성을 경고한다. ‘내 행동이 아무런 차이를 빚어내지 못한다면 나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중략) 내 기여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는 믿음은 사회와 정치를 바꾸겠다는 개인의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운명론적 세계관까지 부추긴다’고 말이다.
책에는 이 밖에도 ‘부의 극대화가 정의’라고 말한 로널드 코스의 주장이 왜곡돼 시장만능주의로 발전한 과정, 잘못 계획된 인센티브 제도가 인간의 자율성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등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함께 담겼다. 특정 개념이 강조해 온 내용과 이에 대한 반박이 마치 팽팽한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는 스포츠 경기처럼 촘촘하고 흥미롭게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