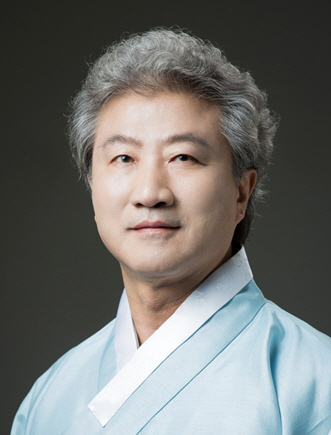사전(辭典)이 진화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사전을 ‘최근에는 콤팩트디스크 따위와 같이 종이가 아닌 저장 매체에 내용을 담아서 만들기도 한다’고 뜻풀이한다. 왜 사전은 종이가 아닌 콤팩트디스크 따위의 저장 매체에 담기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종이로 만들어진 사전을 집 안에 보관한다고 상상해보자. 첫째, 그것들을 소장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꽤 큰 책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적잖은 공간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 종이 사전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오늘날의 새로운 정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종이 사전 편찬자들에게 오랜 세월 숙제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전을 ‘진화’시키는 밑거름이 됐다.
지난 1768년 영국에서 발간한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은 244년 만에 인쇄본 생산을 중지하고 2012년 인터넷판을 제공했다. 2001년 위키미디어재단은 사용자 참여형으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최초로 직접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은 1992년부터 국어학자 500여 명이 참여해 48만 어휘를 수록한 인쇄물로 발간됐는데 2019년에는 사용자가 어휘를 등록하고 정보를 수정하는 신개념의 국어사전 ‘우리말샘’이 공개됐다.
2021년 국립국악원은 개원 70주년을 맞이해 ‘국악 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한다. 분류 체계 범주에 있어 궁중, 풍류, 민속, 창작 국악, 무용, 연희, 국악기, 국악인 등의 전통 공연 예술 분야를 망라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족 예술까지 아우르는 긴 호흡의 편찬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온라인 공간에서 전통 공연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진과 음향,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인터넷판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멀티미디어 국악 사전’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전 발간 사업을 발판 삼아 어린이와 소외 계층, 외국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나아가 멀티미디어 사전을 통해 축적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사전이라는 또 한 번의 진화를 이룰 계획도 품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새로운 일상을 마주한 2021년. 국립국악원이 추구하는 ‘멀티미디어 국악 사전’을 통해 미래 전통 공연 예술 사전의 진화를 꿈꿔본다. 단순한 정보 제공과 열람 차원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국악 자원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악 향유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기를, 그리고 이런 계기들이 쌓여 정보화 강국을 넘어서는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갈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