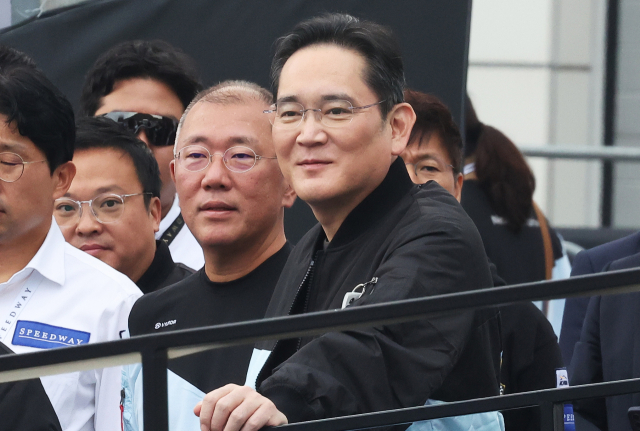지난 1월 6일 발생한 무장 폭도들의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의회는 내부 경비 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 착수했다.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이뤄진 이런 종류의 조사가 거의 언제나 추가 보안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안 절차와 경비 체계가 강화될 때마다 정부 기관 주변에는 겹겹의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무장 경비가 대폭 강화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이다.
필자는 1980년대를 워싱턴에서 보냈다. 당시 연방 의사당 출입은 수월했다. 일단 의사당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널찍한 회의실을 들여다보거나 구내 곳곳에 전시된 조각상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 때로는 분주히 오가는 상원의원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백악관도 접근이 비교적 용이했다. 아예 처음부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1995년의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 1988년의 의사당 총격 사건과 9·11 이후 의사당 방문을 원하는 시민들은 먼저 지하에 설치된 ‘방문자 센터’에 집결해 관광객 준수 사항을 설명하는 영화부터 관람해야 한다. 이어지는 의사당 견학 역시 철저한 통제 속에서 진행된다. 의사당의 경비가 강화된 것과 같은 시기에 백악관 주변에는 볼썽사나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면서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의 일부 구간은 통행이 차단됐다. 지난여름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 이후 백악관 주변에는 더 많은 바리케이드가 세워졌다. 1월 6일의 의사당 난입 사태로 바리케이드 숫자는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보안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안은 개방성·접근성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워싱턴 DC 설계자인 피에르 랑방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정부 건물들을 거리를 오가는 일반인들이 여유롭게 볼 수 있도록 주변 도로들을 널찍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의사당 건축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남북전쟁의 와중에서도 당시 한창 건설 중이었던 의사당 건물은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전됐다. 의사당은 정치인들을 위한 단순한 집무용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기념비적 조형물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 밖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미국의 외교 공관들은 주재국의 수도와 주요 도시의 핵심부에 자리 잡은 근사한 건물이었고 현지 시민들은 그곳에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즐겼다. 필자도 인도 뭄바이의 해변가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미국공보원(USIS) 건물에서 할리우드의 고전 영화를 감상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USIS 건물은 다른 외교 공관들과 마찬가지로 매각됐고 현재 미국의 외교관들은 콘크리트 방폭벽과 몇 겹의 보안 장치가 갖춰진 요새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한다. 물론 주재국 시민들과 직접 마주칠 기회는 거의 없다. 장장 2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두 나라의 수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보라.
미국 정부 기관 건물들은 그 어떤 제국의 구조물보다 더욱 제국적이다. 런던이 세계의 수도로 군림했던 수십 년 동안 영국 총리 관저인 다우닝 10번가는 누구든 걸어서 접근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이 벌인 일련의 폭탄 세례 이후 정부는 총리 공관 주변에 몇 개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인근의 좁은 도로 한 곳을 차단하는 간단한 보안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유별나게 웅장함을 좋아하는 프랑스도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 주변에 나지막한 이동식 장벽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사실 오늘날 워싱턴의 정치판에서는 보안을 강조해야 점수를 딴다. 9·11 이후 세계 곳곳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매년 수십만 명의 현지 민원인들을 빈손으로 돌려세운다. 적정한 민원 신청 자격을 갖춘 방문자들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대가를 치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미국 정부나 미국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자행할 경우 외교관들은 줄줄이 청문회에 불려 나가 곤욕을 치러야 한다. 엄청난 양의 문서가 정기적으로 비밀문서로 분류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별것 아닌 문서를 기밀 사안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해고를 당한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사이 혹은 대중과의 정보 공유 제한으로 나타난다.
폴 라이트 뉴욕대 교수에 따르면 보안 신경과민증은 “정부 조직 내에 여러 겹의 새로운 차단막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한층 둔탁해진 정부는 더욱 폐쇄적이고 관료적으로 변화하면서 유연성을 상실하게 된다.” 폴 라이트는 미국의 정부 조직에 켜켜이 들어선 차단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를 들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의 전쟁 최전선에 배치된 이른바 ‘의료 영웅’들은 개인보호장비(PPE)를 애타게 기다렸다. 하지만 연방보건후생부 최고위 담당자가 국립전략비축물자관리국의 PPE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빽빽하게 들어선 18겹의 차단막을 통과해야 한다. 물론 의료 행정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팬데믹에 따른 경제 봉쇄로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업체들은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금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재무부 사령탑과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 담당국 사이에는 정보의 흐름과 소통을 가로막는 16겹의 막이 빼곡하게 설치돼 있었다. 애초부터 정부 부처와 기구들 사이의 원활한 정보 소통과 업무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였던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정부가 팬데믹에 부실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다. 미국 정부는 거대한 몸집에 조그만 뇌를 지닌 공룡과 흡사하다. 두꺼운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몸체는 안전할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유리된 채 국가가 당면한 현실적 도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비대한 공룡이 미국의 현재 모습이다.
/여론독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