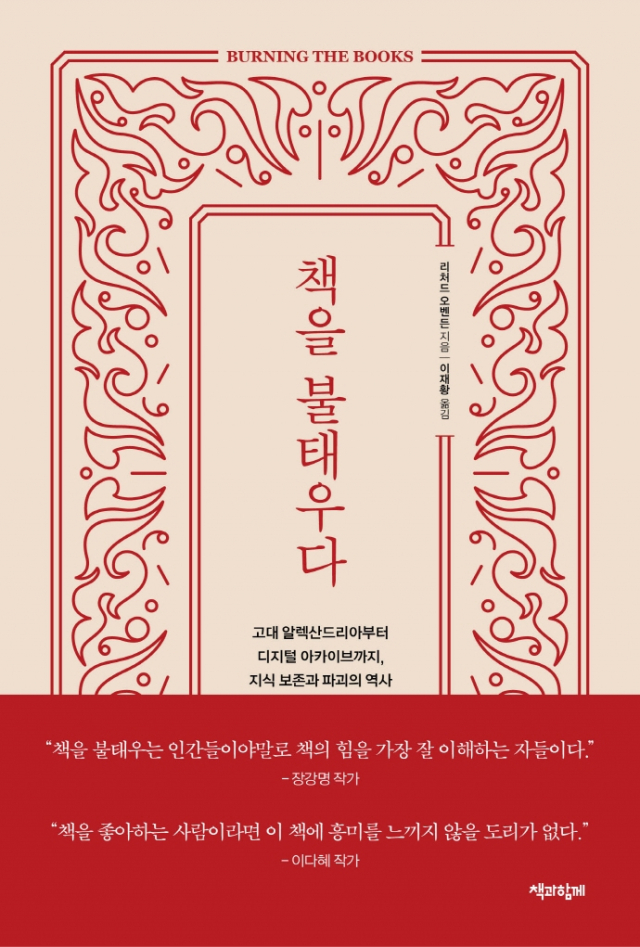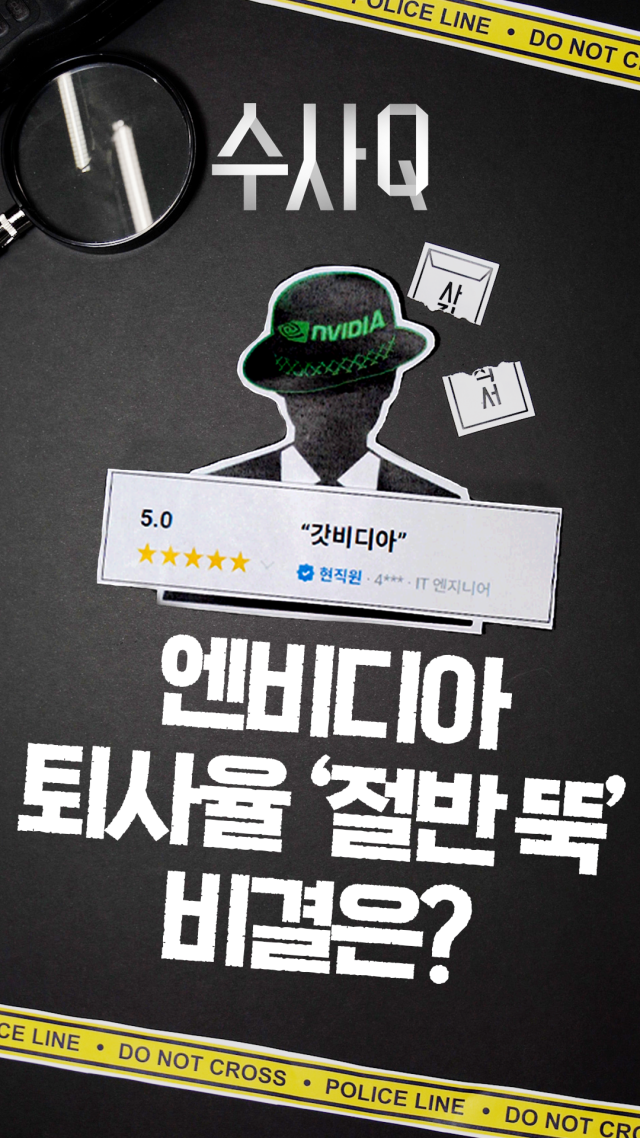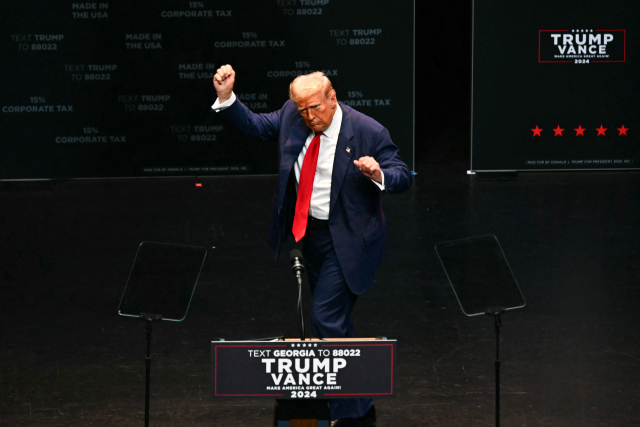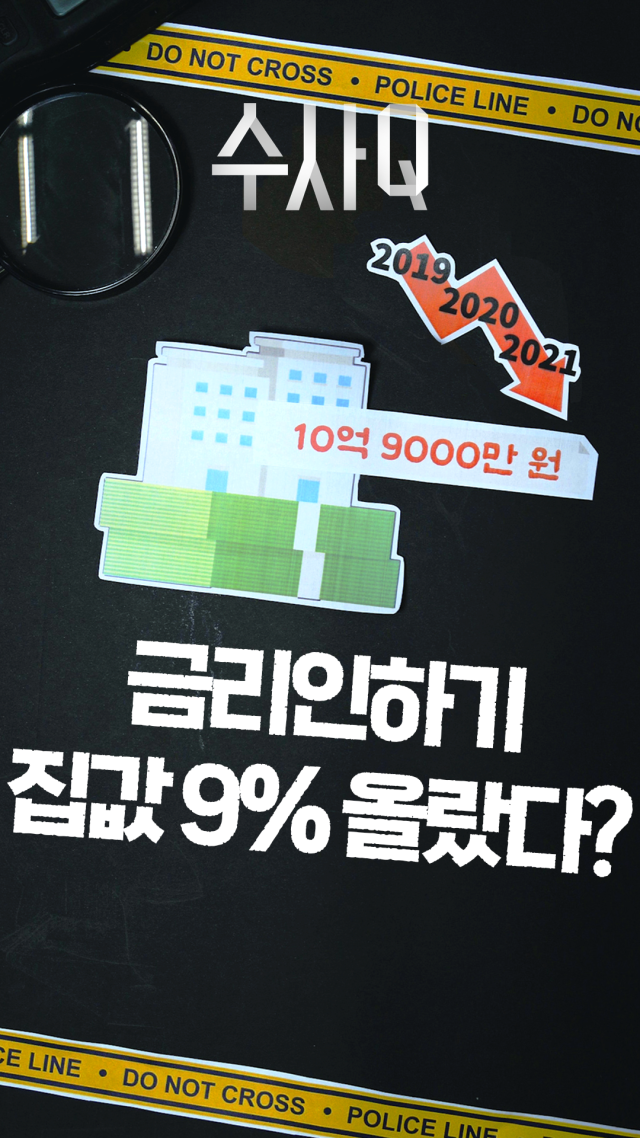책이 불타고 있었다. 지난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광판에서다. 세계적 예술가이자 중국의 반체제 지식인으로 유명한 아이 웨이웨이의 신작 영상 ‘책은 스스로 불탄다’의 한 장면이다. 작가는 ‘1,000년의 기쁨과 슬픔’이라 이름 붙인 자신의 회고록을 태웠다. 기원전 200년 무렵 진나라 시황제가 사상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한 ‘분서갱유’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작가는 2,000여 년 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여전한 사상 통제와 인권 억압의 현실을 책을 불태우는 행위로 비판했다. 그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이기도 했다.
책은 그저 ‘책’이라 불리는 물건이 아니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된 이래로 책은 지식과 역사의 보고였다. 그렇기에 책과 그 책들을 모아 놓은 도서관은 종종 ‘공격의 대상’이 됐다. 서양의 중세 종교혁명 시기에는 수많은 수도원과 대학 도서관이 공격 받았다. 혁명을 주도한 신교도들이 구교의 흔적을 지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대학 도서관 장서의 96.4%가 이 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관을 지난 토머스 보들리(1545~1613)는 1598년 사재를 털어 도서관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렇게 런던 대영도서관에 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옥스포드대학 보들리도서관의 탄생을 이끌었다. 이 도서관의 제25대 관장이 쓴 신간 ‘책을 불태우다’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책과 도서관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들여다본다.
이상적 도서관이며 전설로만 남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전체 도시로 하여금 지혜를 얻도록 고무한 지식의 저장소”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카이사르 군대의 침입으로 책들이 불타고 도서관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도서관은 사라졌으나 우리는 책을 이용하는 학습법,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장소로서 도서관에 대한 관념을 얻었다.
도서관의 흥망성쇠에는 파괴 행위가 따라다녔다. 1814년 미국을 침공한 영국은 미국 의회도서관부터 불태웠다. 정확히 100년 뒤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벨기에의 루뱅대학 도서관을 공격했다. 독일은 세계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종전 후 도서관은 재건됐다. 하지만 히틀러의 나치스는 또다시 지식을 공격했다. 1933년 5월10일 궁전·대학·성당·극장으로 에워싸인 베를린 운터덴린덴 거리에서 4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들이 불탔다. 이날 하룻밤 사이 독일 90곳에서 책의 화형식이 진행됐다. 급기야 독일은 재건된 루뱅대학 도서관을 또다시 파괴했다.
이처럼 한 사회 혹은 국가가 상대의 지식·문화 집적체인 도서관을 파괴하는가 하면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없애고자 한 사건들도 상당했다. 시인 필립 라킨의 일기는 생전에 부탁받은 지인에 의해 사라졌고, 작가 실비아 플래스의 일기 일부도 전남편이 없애버렸다. 바이런이 사망한 후 그의 회고록 원고는 아내와 친구 손에 의해 소각됐다. 모두 저작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서사시 ‘아이네이스’나 카프카의 작품들은 불태우라는 저자의 유언을 지인들이 지키지 않았기에 문화 유산으로 남았다.
저자가 다양한 책과 도서관 파괴의 역사를 짚어본 이유는 바로 지금이 책의 위기 시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9년 평균치로 1분 동안 전 세계에서 1,810만 건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8만7,500명이 트윗을 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책의 13장 ‘디지털 홍수’는 현재의 위기를 진단한다. 저자는 수많은 자료가 디지털로 생성, 유통되지만 이것이 지식 보존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 도서관의 역할은 건재할 수 있을지, 사회의 기억 보존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진다. 특히 우리가 기록을 올리는 SNS 플랫폼 대부분이 거대 사기업의 소유이자 사업 수단이라는 점에서 저자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공공적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데이터 보존 작업에 함께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우려를 표한다.
이게 바로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다. 도서관과 기록관은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지식과 사상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사회의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문화적·역사정 정체성의 근간을 제공한다. “이상적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서서히 쇠퇴한 까닭은 고대인의 안주(安住)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더 늦기 전에 디지털·온라인 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공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고록을 불태운 아이 웨이웨이는 어린 아들이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와의 공감을 추구했다.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