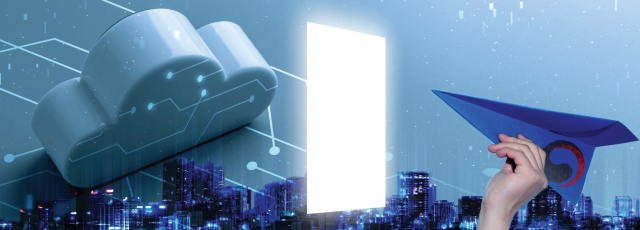이번 대선에서는 정보기술(IT) 관련 공약들이 어느 때보다 눈에 띈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약하기도 했으며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한다. 모두 반가운 소식이다. 정치권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미래 핵심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혁신의 흐름을 주도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지금의 디지털 전환은 단언컨대 우리가 살면서 목격하게 될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다. 3차원 가상세계(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기초 인프라가 바로 클라우드다.
글로벌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클라우드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미 국방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해 사용한 지 벌써 10년이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인 SaaS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업들은 평균 110개의 SaaS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14배가 늘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금융권도 이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IBM과 손잡고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세계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도 은행의 계정계 시스템(core banking system)을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인 ‘소트머신’이 제공하는 SaaS 상품으로 전환했다. 미국 은행이 영국 스타트업의 구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핵심 사업에 사용한 사례다. 국가와 산업·기업 간의 장벽이 허물어진 대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한국 회사의 쾌거는 들려오지 않는 것일까. 한국 기업의 실력이 부족해서일까.
현재 한국 클라우드 상품의 글로벌 활약 사례는 매우 드물다. 수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을 들자면 국내 클라우드 전환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종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2년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예보’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 중 고작 13.3%만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클라우드의 전환 실태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CIA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아마존 클라우드인 AWS를 사용하면서 자국 클라우드 시장의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글로벌 IT 경쟁력은 적극적으로 신기술 도입을 주도하는 것에서 나온다. 자국에서 기업이 쌓은 레퍼런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례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힘이 된다.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까. 정부가 클라우드 도입에 주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해외 수출에 혁혁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국방부와 국정원도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면 첨단 기술을 국방과 보안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탄탄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
IT 산업에 20여년간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에서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CIO도 CTO도 CDO도 아닌, 기업의 대표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앞으로 10년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변화는 시작됐고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과거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와 결단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검토하며 정책을 이끈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저 너머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먹거리가 펼쳐져 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이 기회를 잡는다면 반도체 못지않게 국산 소프트웨어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차기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당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