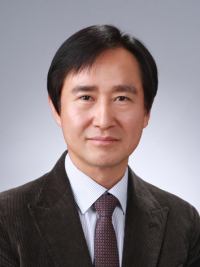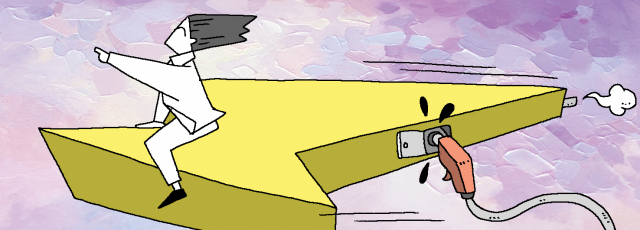몇 년 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후에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자동차 회사 기술 개발 담당 임원이 하던 푸념이 생각난다. 커다란 모터쇼나 자동차 학술 대회 등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대표들의 기술 전망 기조연설을 듣다 보면 이것이 허풍인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서 혼란스럽다고 한다. 올라 셸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미래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30년에 전 차종의 반을 배터리 전기차로 만들 것이고 2039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8년 전에는 전기차로 돈을 벌 수 없다고 했었던 사실을 떠올리면 놀라운 변화다. 벤츠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회사가 비슷한 선언을 하고 있다. 벤츠가 십여 년 전에는 한 차종을 수소연료전지 전기차로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아직까지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 이를 생각하면 최근의 선언 역시 믿을 만한 것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을 위해 자동차 분야도 배터리 전기차로 대변되는 탄소 중립 친환경차 확대를 중심에 두고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공적인 개발은 전기 중심 사회 전환의 발판이 됐다. ㎏당 300Wh에 달하는 성능을 보이는 현재 기술은 500Wh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지난해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이 계획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 8년 뒤인 2030년까지 전기차를 450만 대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시장조사 기구들은 이런 목표치는 비현실적이며 반의반을 이루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유이고 희망 섞인 목표는 특히 자동차 회사의 경우 기술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부풀려져서 과장되면 허풍이 되고 그럴듯하게 계획으로 포장돼 공표되면 자칫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허풍과 거짓말은 정책과 시장을 교란하고 사회와 개인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40년 화석연료 내연기관차 종식을 전제로 무탄소차 선언이 제안됐으나 다른 회사들과 달리 거대 자동차 회사인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은 서명을 거부했다. 전기차 개발에도 매우 적극적인 기술 선도 회사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표 격인 두 회사의 설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기차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배터리 기술 수준과 경제성, 재료 수급, 전기의 공급원인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기 충전 시스템 인프라 구축의 속도 등이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했다.
또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배터리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탄소 저감 성능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배터리의 주요 재료인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의 재료 공급 절벽이 2025년께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의 발달과 수소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재생 합성 연료인 탄소 중립 연료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는 사실을 냉정하게 실용적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는 에너지원 채취로부터 사용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계산하는 전주기적평가(LCA)를 해야 한다. 배터리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를 발생하는 단계의 온실가스양도 만만치 않고 특히 1㎾h의 배터리를 만들 때 60~80㎾h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발전원이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치환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배터리 전기 동력을 갖춘 소형차보다 효율 높은 하이브리드 중형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리어 적다.
과학적 계산은 진실에 가까운 전망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허풍을 넘어서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와 자동차 동력 기술 그리고 에너지 수급 시나리오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