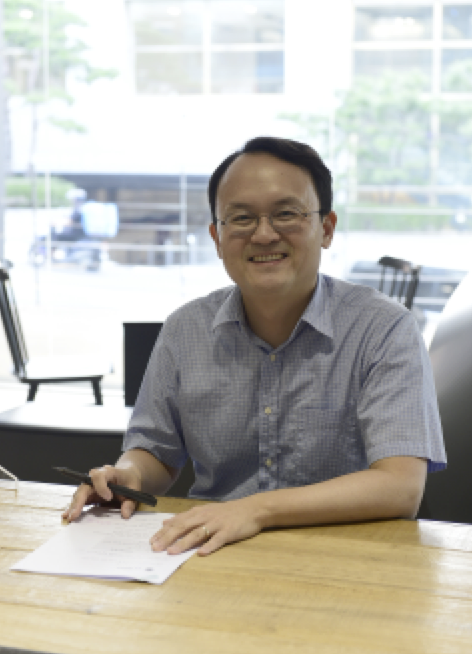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비호감 선거’라고 부른다.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싫어하는 후보를 택하는 선거라는 말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들의 자질이 일반 유권자의 절대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하나의 이유다. 그리고 과거 대통령 후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봐도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도 양당 후보들 중 누구도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현상은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선거가 ‘비호감 선거’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의 논리가 도덕의 논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정치 논리의 핵심은 ‘타협’이다. 한 나라에 존재하는 개인 및 집단의 선호는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인도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정치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제시해 타협을 유도해야 한다. 한 특정 집단이 아무 불만 없이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사회 어딘가에 숨어 있는 다른 집단이 큰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정치인은 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타협의 원리에 충실한 정치인은 모든 사람과 집단이 조금씩 불만을 갖는 상황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상황으로부터 한 발씩 물러나 차선의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하나의 건강한 민주주의 공동체로 운영될 수 있다.
도덕의 논리는 정치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덕의 논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은 계도의 대상, 배제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친일 행보를 보인 사람의 후손, 다주택자, 이중국적자를 자식으로 둔 공직자, 권위주의 정권인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사람 등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도덕적으로 열등해 보일 수 있다. 사람들의 의견과 선호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인이 이러한 도덕의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믿게 돼 ‘나의 편은 옳고 남의 편은 옳지 않다’는 편 가르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편 가르기로 양극화된 정치권에서는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절대 양보하지 않는 대치 상황이 고착화된다. ‘비호감 선거’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승자는 패자를 범법자 혹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로 보지 말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자로 여겨야 한다. 동시에 승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는 대신 패자에게 숨 쉴 여지를 줘야 하고 패자는 그 대가로 승자에게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선거 후에도 도덕의 논리에 충실한 국정 운영이 이뤄진다면 오는 2027년 대통령 선거는 올해 선거보다 더 심각한 ‘비호감 선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