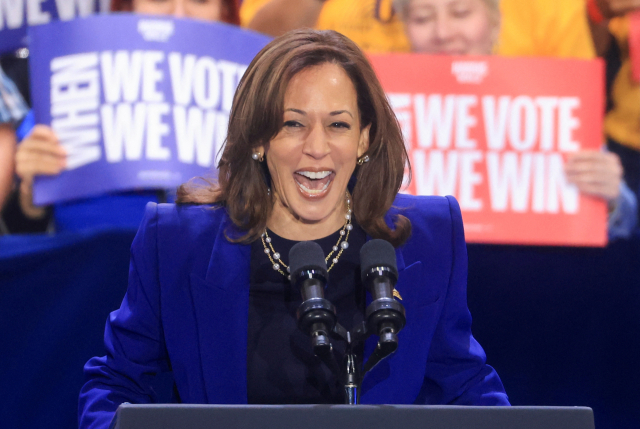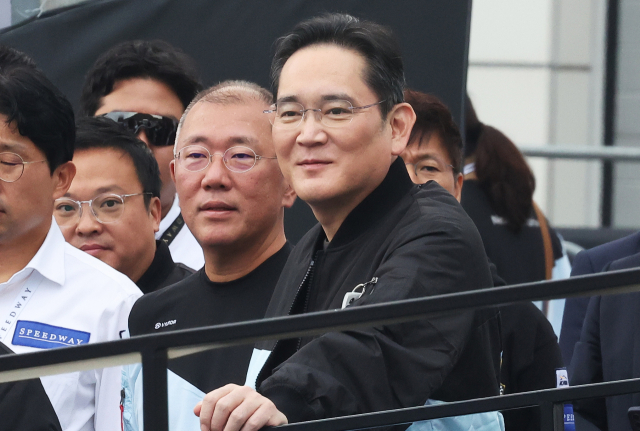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태 발생 전후 3주간 국제 선물 시장에서 밀은 37.7%, 옥수수 가격은 13.2%나 올랐다. 밀의 일부 품종은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거래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제재도 확대되면서 식량 수출이 막힐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 2위 밀 수출국이며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의 밀·옥수수 수출국이다. 세계적으로 두 나라의 곡물 수출 비중이 큰 데다 남미의 수급 상황도 좋지 않아 국제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밀 값 폭등은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연간 435만 톤에 이르는 밀을 소비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밀 소비량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이며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그쳤다. 100%에 가깝던 쌀 자급률도 2020년에는 92.8%로 하락했다.
국제사회는 2020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곡물 수급난을 겪은 바 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인도·베트남·캄보디아·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한동안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수급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식량 위기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농작물 재배 지도가 달라지고 폭염과 홍수·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곡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위기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토양에도 위협으로 작용한다. 가뭄과 사막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의 면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농경지의 지력도 점점 떨어져 농업 생산성이 약화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현재 지구 토양의 33%가 훼손된 상태이며 오는 2050년에는 90%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엔의 관측대로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100억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농경지를 늘리지 않고도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인류는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반도 역사상 전대미문의 기아 사태인 경신 대기근 때도 냉해·수해 등 기후변화로 1670~1671년에 약 100만 명이 사망했다.
국제적인 식량 위기에 대비해 중국·일본·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들이 공공 비축 관련 전담 기관을 두거나 비축 물량을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물류 차질 등을 고려해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쌀·밀·콩의 공공 비축 매입량을 늘리고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비축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식량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한 식량의 비축?물류?가공도 한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 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복합 단지)를 조성해 유사시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식품 산업의 저변도 다져나가야 한다.
1991년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한 직접적인 원인도 식량 부족에 따른 경제난 가중이었다. 2010년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운동 역시 식량 가격 폭등에 따른 시위에서 비롯됐다. 이들 식량 위기의 역사가 남긴 교훈은 짧지만 명확하다. 식량 안보는 국가 차원에서 서둘러야 하는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