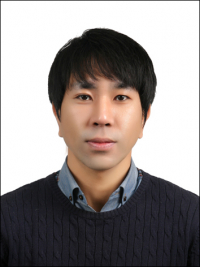“한 달 동안 나에게 연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언제 찾을지 모르지만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글이라도 써놓는다. 글이 끝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일 것이다.”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생을 마친 한 30대 남성의 메모다. 숱한 사건사고 기사를 접하지만 몇일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는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떠나지 않는다.
고인은 지난 2일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한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다. 세상과의 마지막 소통은 2월말, 가족도 친구도 아닌 배달음식을 주문한 통화기록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그는 지원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지만 건강 악화에다 경제적 허덕임까지 덮치면서 끝내 삶의 마지막 순간 외로이 눈을 감았다.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매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3488명에 달한다. 2012년 1025명에서 불과 10년도 안돼 3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층이 주를 이뤘던 고독사가 중년층과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0대 이하 무연고 사망은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40대와 50대까지 포함하면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0만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온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10~30대의 사망 원인 중 극단적 선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통계와 비교했을 때 고작 몇천명에 불과한 무연고 사망자가 무슨 대수냐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뿐 아니라 연락이 끊긴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망으로 분류된 실종선고자, 극단적 선택으로 몸숨을 잃은 청년들까지 고려하면 고독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질병 사망과 달리 고독사의 경우 청년들이 처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가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년 고독사는 취업난과 고용 불안, 가정의 붕괴, 개인주의의 확산, 사회안전망 부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 중에서도 빈곤과 우울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따라 그 출발선이 달라진다. 냉혹한 경쟁사회 속에서 아직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청년들은 한 번의 실패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지기 십상이다. 게다가 1인 가구가 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고독사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을뿐더러 정책은 여전히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고독사가 늘수록 정부에만 의존하는 관리 정책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리가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시민단체, 기업 등 민간 주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돈이 많든 적든, 계급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 죽음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어떠했느냐를 보면 전혀 평등하지 않게 느껴진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청년의 죽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이유다. 더이상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