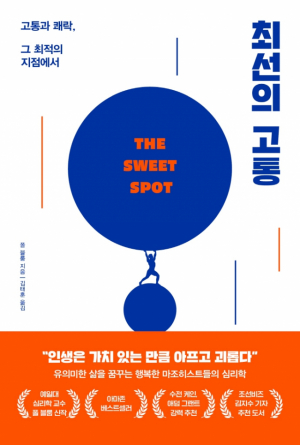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었다. 심지어 외국에서 활동하던 이들도 본국으로 돌아가 동참했다. 고난의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제발로 걸어들어간 것이다. 그들은 왜 고생과 공포를 선택한 것일까?
이 책은 그런 ‘괴로움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란 평온하고 안락한 상태가 아닌 위험과 모험을 겪으며 스스로에게 온전히 몰입하면서 성취와 성장을 얻어가는 삶이라는 뜻이다.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인 저자는 쾌락주의자부터 프로이트까지 수많은 철학자·심리학자들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인류는 진화를 위해 고통과 고난을 겪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비장한 참전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눈물 혹은 공포에 휩싸여 보는 영화, 위장이 뒤틀릴 정도의 매운 음식, 육체를 극한의 한계로 몰아붙이는 운동경기 같은 일상에서 택하는 자잘한 고통들이 있다.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듯 부정적 감정 이후에 따라오는 정화 효과 같은 단순한 얘기를 풀어놓는 책은 아니다. 저자는 카타르시스 이론에 대해 “확실하게 죽은” 심리학 이론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신화나 영웅, 위인 이야기의 전개과정에 꼭 등장하는 고난의 극복이 오히려 저자의 의도에 더 가까울 듯하다.
책은 자해를 일삼는 청소년,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성적 지향, 자녀의 죽음같은 비선택적 고난의 의미, 아이를 갖는 고됨과 삶의 의미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다. 주장은 상당히 고매하다. “고통은 불안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심지어 자아를 초월하도록 도와준다.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고난을 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지 드러낼 수 있다.”
선량한 고통을 딛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최적점(Sweet Spot)을 찾아가는 균형감이 필요하다. “픽션과 현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즐기려면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특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면서 “공감, 고뇌, 걱정이 즐거움을 압도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절호점, 혹은 최적점이라고 했다.
모든 고난이 다 삶의 거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유형의 선택적 고난이라야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책의 의도는 “잘 살아낸 삶은 쾌락적 삶보다 더 많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고생과 난관을 거쳐야 하는 고난은 고귀한 목적을 이루는 한편 완전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데 필수적 요소다”는 말로 요약된다. 1만 7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