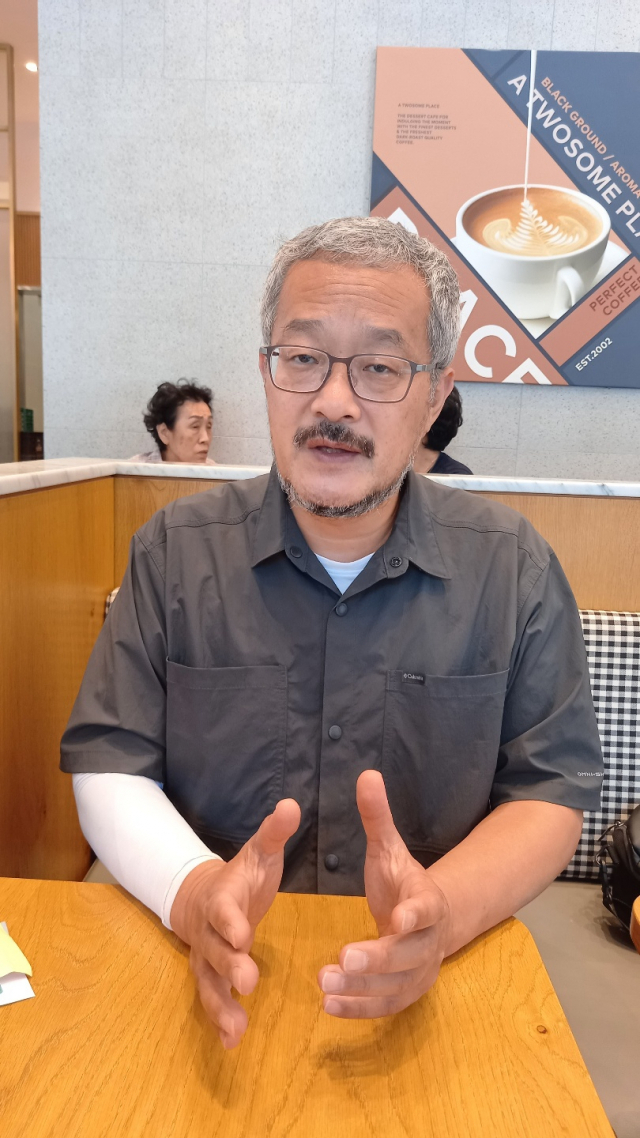“섬 하면 대부분 관광지 또는 환경 보존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죠. 그러다 보니 섬 주민들은 있어도 없는 존재,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24년간 섬만 연구한 강제윤(사진) 섬연구소장은 30일 서울 신도림동의 한 카페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육지 중심의 사고가 섬을 죽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남 완도 보길도 출신인 강 소장은 1998년부터 섬을 연구한 국내 최고의 섬 전문가다. 그가 찾은 섬만 지금까지 400곳이 넘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사는 섬은 496개로 국내 유인도 10곳 중 8곳은 그의 발길이 닿았다는 의미다. 열정은 대단하다. 섬을 가기 위해 하루 800㎞ 길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다.
강 소장에게 있어 섬은 단순히 바다에 떠 있는 산이 아니라 영토 확장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 영토는 육지 영토의 4.4배나 된다. 영토가 된다는 것은 곧 매장된 지하 자원과 어족 자원이 우리의 관리하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독도를 생각하면 쉽다. 섬의 중요성을 아는 주변국이 우리나라의 섬을 사들이려는 시도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강 소장은 “한때 중국인이 조선족을 앞세워 충남 태안의 격렬비열도를 매입하려 한 적이 있었다”며 “만약 성공했다면 제2의 독도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섬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섬을 관광지나 희귀 동물 서식지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게 그의 평가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섬을 ‘관광 및 여가 활동 공간’이라고 답한 비율이 70%를 넘는다. 다음이 생태·환경 등이고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대답은 가장 적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섬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강 소장은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한반도를 덮친 후 동해상으로 이동했을 때 울릉도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기상청과 일반 국민들은 육지에서 태풍이 빠져나가 다행이라는 투로 평가했다”며 “육지 중심의 사고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사는 섬은 40년 전 996개였지만 지금은 496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살기가 불편하니 사람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 유인도가 무인도로 바뀐 것이다. 무인도가 되면 섬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그가 섬을 관광지가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잘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는 이유다.
환경 단체들과의 충돌도 빈번하다. 대표적 사례가 흑산도 같은 섬에 소규모 공항을 만드는 것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다. 환경 단체들은 공항이 들어서면 철새가 오지 않고 애기뿔소똥구리 같은 멸종위기종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 소장은 이를 섬 주민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말한다. 적어도 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흑산도의 경우 1년에 배가 안 뜨는 날이 100일이나 됩니다. 1.2㎞짜리 활주로 하나만 만들면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섬 주민들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열악한 의료와 교육 시스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대부분의 섬 주민들이 갑자기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해도 의료 시설이 없어 골든 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무엇보다 응급 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가장 이상적인 섬의 모습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립을 이룬 충남 보령 장고도를 꼽았다. 이곳은 어촌계가 해삼과 전복을 공동 양식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구당 1000만 원씩 기본 소득처럼 배당한다. 전체 79가구 모두 바지락 공동 양식에 참여한 수익을 나눠 갖는다. 그는 “대부분의 어촌계는 진입 장벽이 높은 승자 독식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다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 어촌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