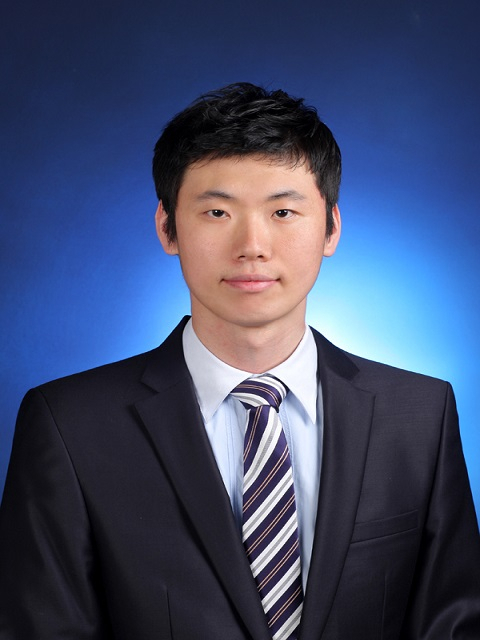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가 오르며 커진 이자 부담에 빚을 갚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감소분 7조 9914억 원은 같은 기간 신용대출(한도대출 포함) 감소분(7조 7579억 원)과 엇비슷한 규모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대출 목적이 불분명한 마이너스통장부터 해지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았다면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된 가계대출은 더 큰 폭으로 줄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채무자의 조기 상환으로 금융권의 자금 운용에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익 감소에 대한 보상이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벌어들인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총 1286억 원에 달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출 원금의 0.6~1.4% 수준이다. 대출 잔여 일수가 조금 남을수록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슬라이딩 방식이다. 특히 대출 금액이 크고 대출 기간이 긴 주담대의 경우 해마다 대출 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3년이 지나면 완전 면제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를 묶어두는 족쇄 역할을 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조기 상환에 페널티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하나같이 신용대출에 대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리 경쟁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주담대를 출시한 카카오뱅크는 주담대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선언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국면을 틈탄 과도한 중도 상환 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경감 조치를 운영 중이다. 주택금융공사도 이달 말까지 서민 대상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70% 감면한다. 반면 지난 2년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5대 은행은 인터넷은행의 실험이나 공적 기관의 고통 분담을 애써 못 본 체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은 옛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