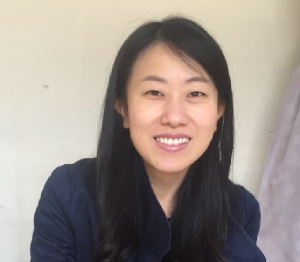“나는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2019년 영화 ‘증인’에서 자폐인이자 증인인 지우는 이렇게 말했다. ‘증인’의 각본을 쓴 문지원 작가에게는 이 대사가 소중했던 것 같다. 그로부터 3년 후, 문 작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탄생시켰다. ‘증인’과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폐인 변호사가 마침내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TV쇼 부문 10위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우영우 변호사는 내로라하는 로펌에 소속돼 까다로운 사건들을 해결한다. 워낙 출중한 변호사인 데다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조력자들도 있다. 현실에서 마주치기조차 어려운 자폐인이 활약하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크다. 자폐인뿐만 아니라 미혼부·레즈비언도 태연하게 등장한다.
게다가 이 드라마는 판타지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반추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 죽은 의대생 형과 자폐인 동생이 등장하는 3화에서 우 변호사는 ‘의대생이 죽고 자폐아가 살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뉴스 댓글을 읽는다. 지난해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의 죽음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우리 중 일부는 그 의대생의 죽음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동시에 일터에서 어이없는 안전사고로 사망한 젊은이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저 댓글과 닮은 가치관을 드러낸 바 있다.
좋은 학벌, 재산, 장애 유무가 목숨의 가치를 결정짓는 사회에서 우 변호사의 일상은 녹록지 않다. 우영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등장인물 한 명은 해맑은 얼굴로 ‘파이팅’을 외친다.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짧고 강렬하게 꼬집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최고 로펌의 변호사도 아닌 장애인, 우영우처럼 귀엽지 않은 현실의 장애인들을 이 사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애초에 ‘대하다’라는 말조차 꺼내기 민망한 현실이다.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극장과 쇼핑몰에서 종종 장애인을 마주칠 수 있는 이른바 ‘선진국’과 비교되는 현실이다. 한국의 장애인들은 열악한 인프라 또는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시선 때문에 대체로 보이지 않는 존재다.
이쯤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를 떠올리게 된다. 두 단체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권리, 주민센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자로 정보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수십 년째 외쳤지만 별로 바뀌는 것이 없었기에 때로는 지하철을 멈추기도, 음성 안내나 점자 패드 없이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만 세워 놓은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려가기도 한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이들의 모습은 결코 우영우처럼 무해하지 않다. 성난 얼굴과 고집스레 외치는 구호는 우영우의 세계와는 딴판이다. 그럼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언뜻 판타지처럼 보이는 장면들을 내세워 지하철 시위, 패스트푸드점 시위가 벌어지는 그곳을 애타게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장애인인 우영우와 그렇지 못한 현실의 장애인들. 그 괴리를 감지하는 시청자들이 늘어날수록 드라마의 의의는 깊어질 것이다. 또 그래야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경험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