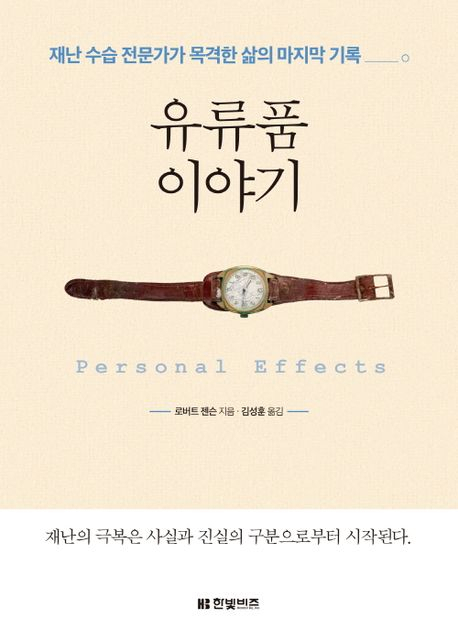“이름을 찾아주는 것을 빼면, 존엄성이야말로 우리가 죽은 자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이미 빼앗기고 없는 이들이다. 우리는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작업해서 시신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야 가족들이 과거의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로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슬픈 일이다. 우리가 슬픈 이유는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할로윈데이였던 지난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건만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책임자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 유가족은 ‘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나’고, 불의의 사고로 떠난 이들의 이름이라도 제대로 불러달라고 오열한다.
신간 ‘유류품 이야기’는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죽음을 처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아온 사람의 회고록이다. 저자 로버트 젠슨은 세계 최고의 재난수습기업 케니언 인터내셔널의 대표다. 그는 미국 9·11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등 충격적 사건의 현장을 누볐다. 미 육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1998년부터 지금 회사에서 일했다.
저자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몰던 자동차 사고로 두피에 수십 개 유리조각이 박히는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고백한다. 재난의 수습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이다. 저자는 오클라호마 폭탄테러 사건 당시, 유리 파편과 건물의 금속 뼈대가 쌓인 1.5m의 지면에 서서 275명의 유해를 찾아야 했다. 아래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덮치지 않도록 조심히 길도 내야 했다. 한 번은 산산이 부서진 시신을 수습해 안장했건만, 다른 곳에서 다리가 발견되는 바람에 무덤을 다시 파는 일도 겪었다.
책은 재난과 참사의 현장을 만나게 한다. 끔찍한 장면으로부터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재난과 참사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희생자와 그의 마지막 소지품 찾기에 사력을 다한다.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구 다목적실내체육관에 주인 잃은 신발과 옷가지 등 희생자 유류품을 모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자는 “유족은 상실이 아니라 상실에 대응하는 방식에 화가 난다”는 것, “끔찍한 일은 하루 빨리 털어버리는 일이 능사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을 기회를 준다”는 사실 등 자신의 깨달음을 함께 전한다. 1만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