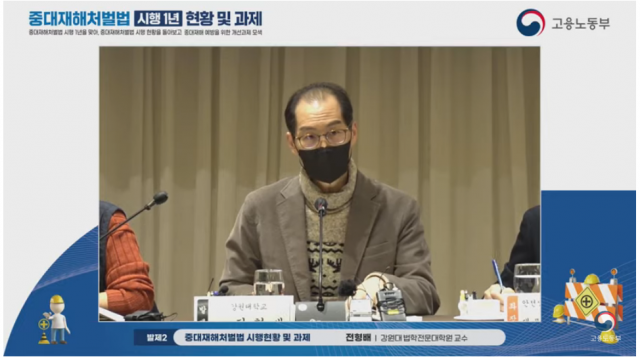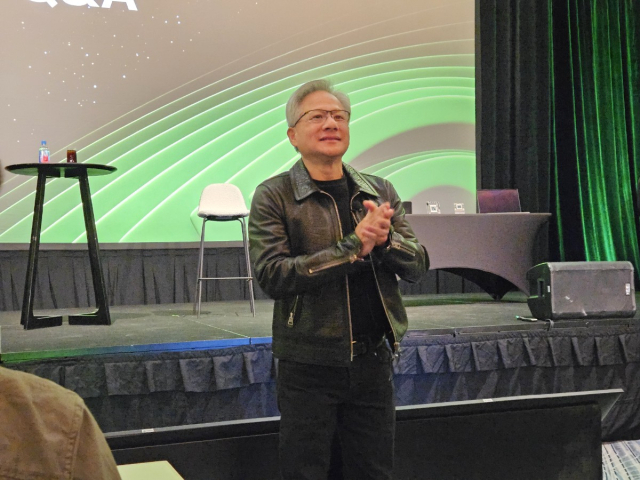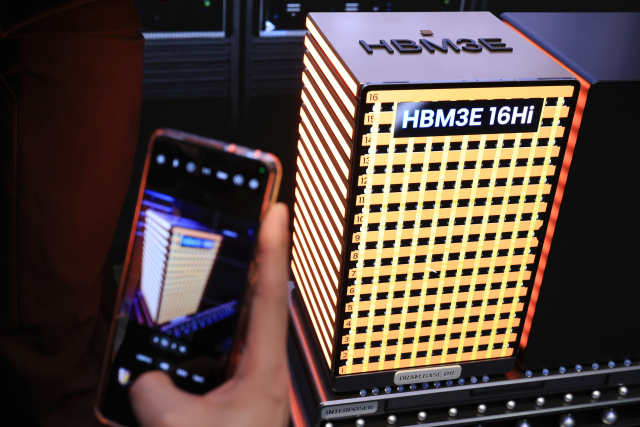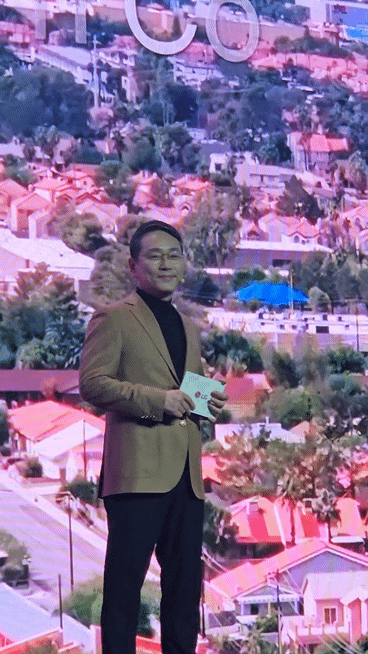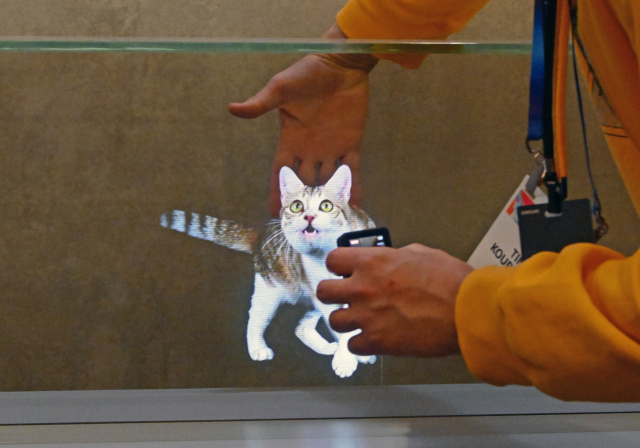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선안을 내놓을 전문가 기구가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법 사건은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1심 재판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처벌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사업장에 대한 많은 안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1월 발족한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 중이다.
작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작년 말까지 229개 수사건 가운데 52건(22.7%)만 처리됐다. 1차 수사를 맡은 고용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4건,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에 불과하다. 1심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아직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속한 수사 이후 판례가 쌓이면 중대재해법의 ‘형사처벌 공포’를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중대재해법 개선 TF에 참여 중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동발제자로 나서 “(기업이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한) 로펌이 근로감독관 보다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상황일 정도”라며 “(법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탓에 (기업이) 처벌만 피하려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의 로펌 의존도가 중대재해법의 문제로 불가피하다고 항변해왔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사건 첫 재판도 없는 상황에서 개선안 논의가 섣부르다고 우려해왔다. 김 교수도 “(경영계의 주장처럼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불명확하지 않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는 기업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개선 TF가 신속한 수사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느린 수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부하가 꼽힌다.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체계 의무를 확인해야 하는 탓에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사건 수사를 위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는 1건당 평균 18회나 기록했다. 근로감독관도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고용부가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교수도 “중대재해법은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라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