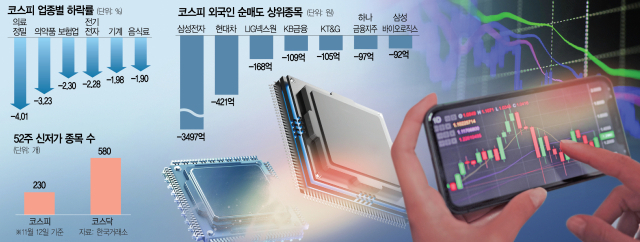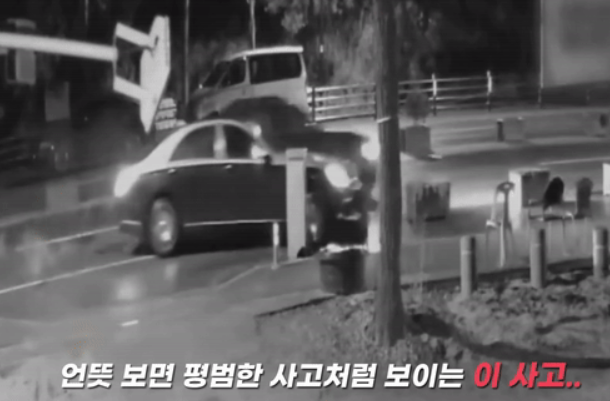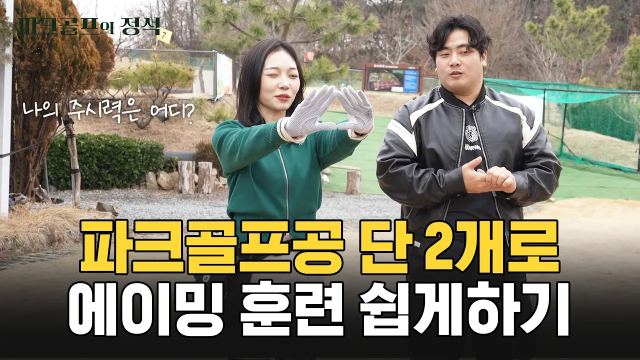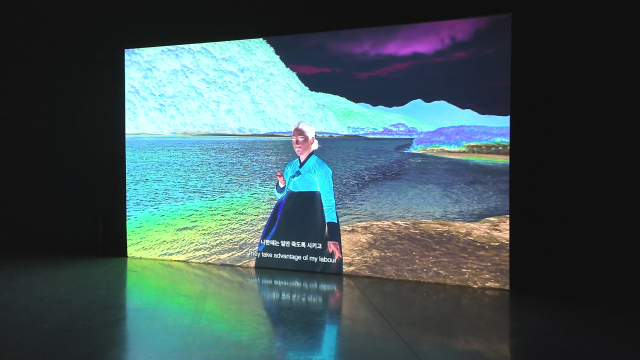최근 10여 년 동안 2030세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의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에 긍정적 인식이 최대 30%포인트 낮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모든 세대의 소득이 증가하는 동안 20대 이하 가구만 소득이 줄었고 빚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다. 각박한 경제 형편이 인구 선행지표 격인 혼인율까지 끌어내리는 인구구조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지난해 기준 27.5%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결혼을 원했던 2008년(52.9%)과 비교하면 2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결혼에 긍정적인 20대 남성의 비중도 71.9%에서 41.9%로 떨어졌다. 30대의 경우 남성은 69.7%에서 48.7%로, 여성은 51.5%에서 31.8%로 비율이 각각 낮아졌다. 남성보다 여성이, 30대보다 20대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낮았다.
모든 연령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지만 이는 2030 결혼 적령기 청년층에서 특히 높았다. 20대는 결혼 자금 부족이 32.7%, 30대는 33.7%로 가장 높아 다른 연령층(20%대)에 비해 월등한 수치를 기록했다.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인식도 높아져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증가했다.
20대 소득 줄고 빚만 늘어…미혼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와 산다
청년 부채 대부분 전월세 보증금
근로소득 증가·안정적 주거 시급
경제적 여건 탓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형편에 20대 청년의 생활은 최근 3년간(2018~2021년)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팍팍해졌다. 이 기간 20대 이하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7%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가구소득은 2018년 3363만 원에서 2021년 3114만 원으로 7.4% 줄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경우 가구소득이 30대 11.5%, 40대 10.8%, 50대 10.6%, 60대 이상 22.5% 등으로 증가해 전체 가구소득은 4567만 원에서 5022만 원으로 늘었다. 모든 세대의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 20대 소득만 유일하게 뒷걸음질 친 것이다.
그렇다 보니 60대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이 처음으로 20대 청년 가구를 추월했다. 60대 가구의 연 소득은 3189만 원으로 20대 가구(3114만 원)를 넘어섰다. 4년 전인 2018년까지도 20대 가구의 연 소득은 3363만 원으로 60대(2604만 원)를 크게 앞서 있었다. 고령층이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 수입,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등 재산소득에서 청년과 노인 가구의 방향이 엇갈리게 됐다.
반대로 부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에서 큰 폭 증가했다. 부채 보유 비율은 20대 이하의 경우 2018년 50.8%에서 2022년 60.4%로 9.6%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은 64.1%에서 63.3%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대 이하의 지난해 부채 보유액은 가구당 5014만 원으로 2018년보다 93.5% 늘었다. 같은 기간 8088만 원에서 1억 1307만 원으로 빚이 늘어나 39.8%의 부채 증가율을 기록한 30대와 비교해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
특히 청년층 부채의 대부분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8~2022년 20대 이하의 금융자산은 36.5% 늘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대 이하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전월세 보증금(70.1%·2022년 기준)이 차지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부채가 늘면서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도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오르지 않는, 말그대로 빚더미 위에 거주하는 셈이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청년 세대의 높은 부채는 전월세 보증금 증가와 맞물려 주택 가격 불안정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근로소득 증가,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지 않은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방법을 선택했다. 지난해 19~34세 청년의 가구 유형 가운데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 가구가 5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년 독거 가구(25.4%), 청년 부부 가구(8.1%), 청년과 자녀 가구(6.8%)가 뒤를 이었다. 혼자 사는 청년 독거 가구의 경우 40~50%가 연립 다세대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나 지하·옥탑방에 사는 청년 독거 가구 역시 전체 청년 가구의 0.9%를 차지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독거 가구의 반지하·지하·옥탑방 거주율이 3.24%로 가장 높았다. 자연스레 80% 이상의 청년들이 주거 정책으로 전세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을 꼽았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2030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짙어지는 원인을 해결하려면 청년들이 중시하는 경제적 여건과 양성평등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결혼 적령기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의 선택을 받는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날 내년 1분기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년마다 인구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4차 계획은 2025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전날 최악의 경우(저위 기준) 2026년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진다는 통계청의 전망에 이어 사회동향까지 잇따라 발표되자 4차 계획 수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