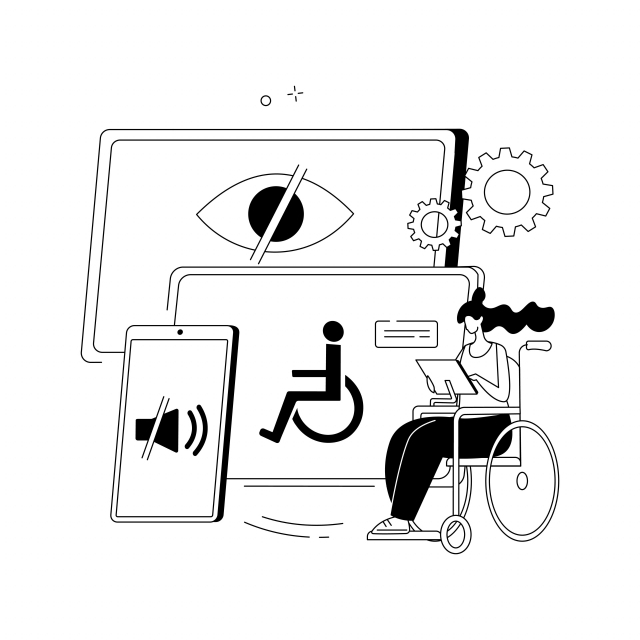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정보기술(IT) 기업이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 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비용 부담이 적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IT 기업에서 뽑을 수 있는 장애인 인재 풀이 좁은 것도 문제’라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올 초 발표한 ‘2023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 공표’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률(3.1%)을 밑도는 IT 기업은 30여곳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는 업종이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언론·출판사 등을 제외한 수치다. IT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된 업체도 있어 이들 회사까지 포함한다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IT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IT 기업들 중에는 넥슨게임즈,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 주요 회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0.6~1.3% 수준으로 의무 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IT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농심(1.10%), 한화(1.41%) 등이 있었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나이키코리아(0.24%), 한국씨티은행(0.5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72%) 등이 포함됐다. 특히 프라다코리아, 남광토건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0.00%에 그쳤다. 전 직원 중 장애인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낮은 벌금을 꼽는다.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률(3.1%)을 모두 채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일정 수준까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남은 부분은 벌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31명인데 이들에게 최저임금(206만 74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7억 7000만 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장애인을 절반 수준인 16명만 채용하고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에 따른 부담금을 낼 경우 인건비 약 4억 원에 벌금 약 2억 4000만 원만 부과하면 된다. 총 6억 4000만 원으로, 장애인 근로자 전부를 고용했을 때의 인건비 대비 1억 3000만 원 가량 저렴하다.
다만 기업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IT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회사 이미지와 복지 등을 생각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인력 풀이 너무 좁다”며 “바리스타 등 특정 업종에만 성격이 제한돼 있어 개발이 중심이 되는 IT 기업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IT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코딩·개발 교육을 확대하거나 정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시켜주는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 한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에 무관하게 필요 인력을 꼭 채워야 한다”면서도 “다만 채용 과정에서 직군을 잘 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등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