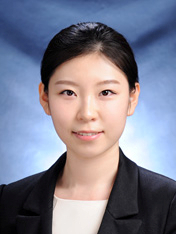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삼성그룹이 진행한 사업 재편 중 하나였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됐다. 매출 25조 원 규모의 플랜트 전문업체의 탄생이 기대됐지만 합병 효과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전망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발목을 잡았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되사달라고 요구한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이 한도를 넘어서면서 결국 합병을 포기했다. 청구권에 막혀 합병이 철회된 사례는 그동안 왕왕 있었다. 2014년 네오위즈게임즈와 네오위즈인터넷 합병도 청구권 한도 초과로 무산됐고, 2008년에는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이 같은 이유로 합병 포기를 선언했다.
최근 합병이 무산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은 이 같은 시장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금융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주이익 침해를 이유로 수차례 합병안에 대한 정정요구를 했고, 결국 두산은 원점에서 합병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일일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두산의 분할 합병안에 위법행위가 없었지만 금융당국이 시장 심판자를 자처하며 직접 개입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병 비율 논란은 두산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지 금융당국의 심판을 받을 문제는 아니었다"며 "두산이 주총까지 주가 부양과 주주 설득에 실패할 경우 청구권 행사에 막힌 이전 사례들처럼 시장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두산의 사업 재편은 반 쪽 짜리에 그치게 됐다. 두산밥캣은 기존대로 손자회사로 남으면서 스마트머신 기업 인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의 재무적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자율주행 시장 진출이 늦춰질 전망이다.
최근 재계에서는 두산뿐만 아니라 SK, 한화 등 주요 그룹에서 크고 작은 사업재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속 악화하는 사업 환경에 큰 투자가 필요한 신사업까지 고려하면 사업 재편 말고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업 재편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오너 배불리기를 위한 꼼수라면 누구든 제동을 거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는 혜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