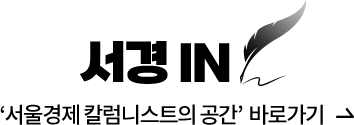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을 위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대의명분(大義名分)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시·도민 모두가 잘 사는 터전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절박한 염원이며, 필자 역시 그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을(What)’ 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How)’ 하느냐이며, 더 나아가 ‘왜(Why)’에 대한 냉철한 실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불쑥 튀어나온 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시·도지사의 전격적인 선언과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추진 과정은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위로부터의 개혁’을 답습하는 듯하다. 이는 ‘지방 시대’라는 정부 기조에 편승하여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보이려는 단체장들의 조급함이 빚어낸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지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흔드는 고도의 화학적 결합이자, 주민의 삶을 재구성하는 거대한 실험이다.
통합 찬성론자들은 앵무새처럼 ‘해외 선진 사례’를 거론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프랑스의 레지옹 개편이나 일본의 오사카도 구상을 보면 우리도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한 팩트체크 결과, 그 실상은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사뭇 다르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첫째, ‘통합하면 효율적’이라는 신화는 깨졌다. 프랑스는 2016년 22개 레지옹을 13개로 통폐합하며 행정 비용 절감을 자신했다. 그러나 프랑스 감사원의 보고서는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임금과 복지 혜택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맞춰지는 ‘상향 평준화’가 발생해 오히려 인건비 등 재정 부담이 영구적으로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규모의 경제를 기대했다가 ‘규모의 비경제’라는 역풍을 맞은 셈이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할 경우, 직급 조정과 처우 개선 비용에 대한 치밀한 추계 없이 막연히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기만에 가깝다.
둘째, ‘행정 통합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등식도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도 구상’을 통해 이중행정을 없애면 오사카가 도쿄와 맞먹는 경제 도시로 부활할 것이라 선전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오사카의 경제적 침체가 행정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산업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2045년 오사카의 고령화율은 3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간판을 ‘특별자치도’로 바꿔 단다고 해서 떠나는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
셋째,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필패한다. 일본 오사카 주민들은 두 차례(2015년, 2020년)의 주민투표에서 통합안을 부결시켰다. 행정 서비스가 거대 광역 정부로 이관될 경우, 내 집 앞의 쓰레기 수거, 돌봄 서비스와 같은 풀뿌리 복지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한 ‘주민의 승리’였다. 독일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통합 역시 1996년 주민투표에서 브란덴부르크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대 도시 베를린에 흡수되어 주변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 즉 ‘흡수 통합’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다. 이는 광주라는 대도시와 전남이라는 농어촌이 결합할 때 전남 도민들이 느낄 소외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지금 광주와 전남에 필요한 것은 깜짝쇼와 같은 로드맵 발표가 아니다. 프랑스의 실패와 오사카의 거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통합의 득과 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 시 발생할 천문학적인 청사 건립 비용, 공무원 조직 개편에 따른 갈등 비용, 그리고 농어촌 소외를 막을 구체적인 재정적 안전장치(Safety Net)를 주민 앞에 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진정한 지역 경쟁력은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속도전’에서 나오지 않는다. 영국이 보여준 것처럼 재정 권한 없는 무늬만 통합은 중앙정부의 통제만 강화할 뿐이다.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고하다면 더더욱 서두를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일방통행을 멈추고, ‘민관정(민·관·정)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바닥에서부터 의견을 모아가는 상향식(Bottom-up)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의 교감 없는 통합은 ‘미완의 봉합’에 그칠 뿐이며, 그로 인한 혼란과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시·도지사는 이제 ‘환상’을 걷어내고 주민과 함께 ‘실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