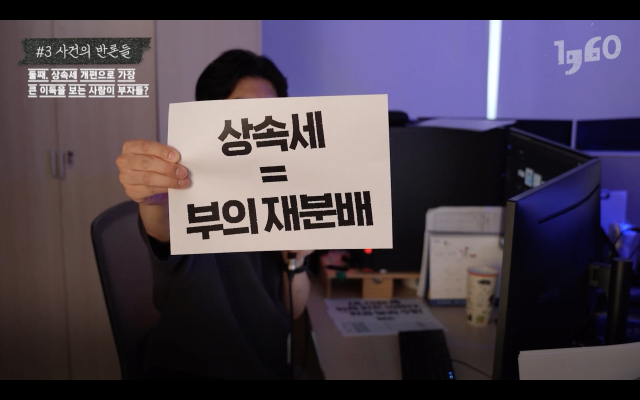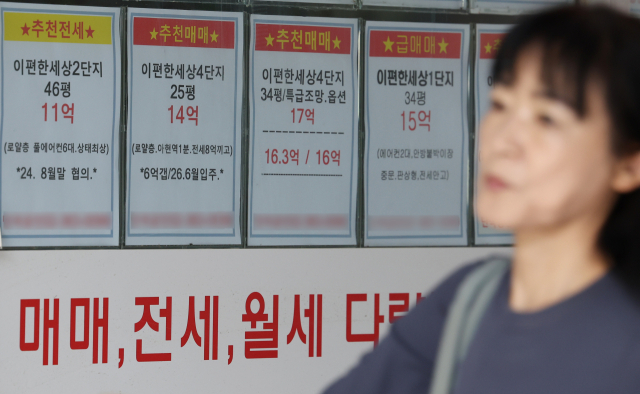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
1990년 5월4일 오후3시, 여의도 증권회관.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긴급모임을 가졌다. 2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기금 창립총회를 갖기 위해서다.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창립일을 앞당겨 출범한 증안기금은 갈수록 커졌다. 증권사는 물론 은행ㆍ보험권에다 상장사까지 포함해 636개사가 4조8,600억원을 모았다. 증안기금이 다급하게 출범한 이유는 최악의 시장상황. '돈을 찍어내서라도 증시를 부양하겠다'던 1989년 말 12ㆍ12조치로 반짝했던 주식시장이 1990년 들어 무기력한 폭락세에 빠져들고 부동산 값이 치솟자 정부는 대책을 쏟아냈다. 대통령이 해외출장 중인 재무부 장관까지 급히 귀국시켜 한달 동안 네 차례나 발표된 대책에는 대선공약이던 금융실명제 연기까지 포함됐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같은 초법적 조치가 나온 것도 이 무렵이다. 소나기 대책 중에서도 증안기금은 부양책의 핵심이며 상징이었다. 증안기금은 효과를 거뒀을까. 평가가 엇갈린다. 3조원의 주식을 매입해 시장붕괴를 막았다는 평가와 정부의 개입장치였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1992년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증권거래소를 방문했을 때는 전산장애를 일으킨 가운데 대규모 매수에 나서 정치적 의혹을 사기도 했다. 증안기금의 매매동향에 따라 시장이 춤춘 적도 많다. 증안기금의 원조격인 일본의 1960년대 공동증권과 주식조합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해체는 쉽지 않았다. 당초 3년 뒤 해산 예정이었으나 수 차례 연장된 끝에 2004년 해체됐지만 조합원 간의 이해대립으로 완전 청산은 올해 1월 말에야 이뤄졌다. 태동에서 청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증안기금은 사라졌지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재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국내에서는 증안기금이 더 이상 필요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