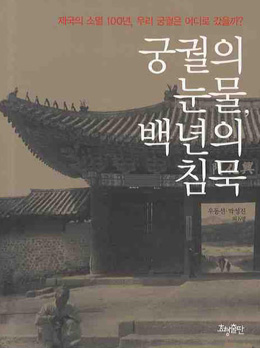홈
사회
사회일반
일제강점기 뜯기고 허물어진 '비운의 조선궁궐'
입력2009.11.06 17:40:25
수정
2009.11.06 17:40:25
■ 궁궐의 눈물, 백 년의 침묵 (우동선ㆍ박성진 외 6명 지음, 효형출판 펴냄)<br>철거·이건 건물 356동4,648칸 달해<br>상당수 음식점·사찰·기생집으로 사용<br>일부 日 제국주의 찬미에 악용되기도
2008년 2월 10일.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다.
69세 노인이 숭례문에 불을 질렀고 5시간 만에 국보 1호가 전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요즘도 사람들은 숭례문 인근을 지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숭례문은 문화재이기에 앞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웃과 같은 존재인 탓이다. 하지만 숭례문 방화 사건보다 더 침통한 일들이 불과 1세기 전에 있었는데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조 500년 역사와 대한제국을 상징했던 궁궐들은 일제의 식민지 말살 정책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훼손됐지만 침탈의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국내 건축학자 8명이 모여 일제 강점기 동안 자행됐던 궁궐 훼손의 역사를 방대한 사료와 고증을 거쳐 낱낱이 추적했다.
일제 강점기에 궁궐 밖으로 옮겨지거나 팔려나간 전각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의 경우 일제 치하에서 철거되거나 이건(移建)된 건물은 356동(4,648칸)에 이른다.
경희궁은 1930년에 이르러 몇몇 회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각이 철거됐다. 이렇게 사라진 전각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정확한 해답은 아무도 모른다. 역사상 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수 전각 가운데 민간에 팔려 이건된 후 음식점, 살림집, 사찰, 기생집으로 사용됐다. 심지어 일부는 바다 건너 일본으로까지 옮겨졌으니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궁궐은 훼손되는데 그친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를 찬미하는데 악용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인 거주 지역이었던 남산과 주변에는 많은 일본계 사찰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 박문사가 유명했다.
박문사는 초대 총통인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로 일본인 및 친일파 위령제, 조선인 교화강습회, 태평양전쟁 필승대회 등이 자행되던 곳이다.
이런 사찰에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을 옮겨와 박문사의 정문으로 사용했으니 식민지 지배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일제의 치밀한 계산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대한제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던 고종이 궁궐 훼손을 방관만했던 것은 아니다. 고종과 조정 대신들은 원구단을 건설하는 등 궁궐 건축을 통해 황권 강화에 적극 나섰다.
황제의 나라 중국과 동등한 위상과 자존심을 나타내기 위해 원구단에서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갖고 근대국가 진입을 적극 꾀했다. 그렇지만 대한제국은 일제의 위력 앞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궁궐들은 하나 둘씩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잃고 변질돼 갔다.
대표적으로 창경궁은 벚나무가 심어지고 동물들이 들어오면서 창경원으로 '타락'했고 평양의 풍경문은 일제의 군사기지로 이용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조선의 궁궐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서양식 근대건축물이 들어섰고 일부는 박람회장으로 사용되며 일제의 국력 과시와 조선에 대한 상징 조작으로 사용됐다. 1만8,000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