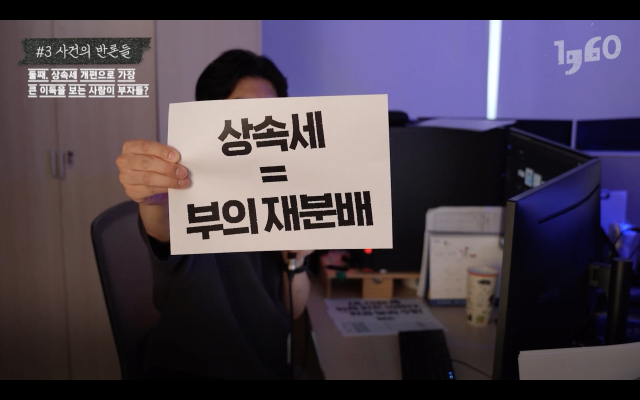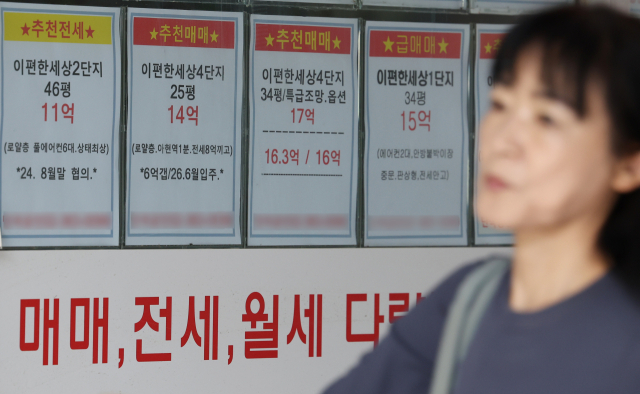어렵게 마련한 연말 모임이 공교롭게도 펑크가 났던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골목길 구멍가게에서 막걸리 한 병과 마른 오징어 한 마리를 샀다. 오랜만에 그리운 이들을 보려다 불발된 아쉬움 때문이었는지 톡 쏘는 홍탁과 함께 싸한 막걸리가 생각이 난 게다. 비록 홍탁을 곁들인 삼합은 아니었지만 적당하게 구운 오징어는 초고추장에, 막걸리는 밥공기에 따라서 혼자 ‘카-’ 소리를 내며 기분을 냈다.
지난 1960년대 전국 국토개발의 뜨거운 열기 한가운데에는 항상 막걸리가 있었다. 대통령도 새마을운동 현장 순시 때면 항상 즐겼다는 그 막걸리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는 쌀이 부족해 쌀 막걸리는 감히 생각도 못할 때였지만 밥집 아주머니들의 후한 인심으로 인부들은 하루 일이 끝날 때쯤 아주머니들이 이고온 돼지머리 고기와 찌그러진 양푼 주전자에 한가득 푸짐하게 들고온 막걸리로 하루 힘든 노동의 한을 달래고는 했었다.
이렇게 새우젓을 찍은 고기 한 점과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안주로 삼고 엄지 손가락을 찔러 잡은 양푼 사발 한가득 마시는 막걸리가 그때의 말죽거리를 강남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만들었고 모래 내 진창길을 아파트 단지로 바꿔놓는데 일조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막걸리는 한동안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춘 듯하다가 쌀 막걸리 주조 제한이 풀리고 재료와 맛이 고급화되면서 다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허옇게 부풀러 오른 양푼 사발이나 플라스틱 바가지에 막걸리를 받아 마시는 모습을 이제는 보기 힘들지만 깨끗한 플라스틱병에 포장된 막걸리는 역 주변 붉은색 포장마차에서 빨간 홍합국물과 함께 혹은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산로 주점에서 파전조각에 함께 바가지 잔에 받아 마시며 즐기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각종 서양 포도주의 부케를 음미하는 애주가가 늘고 일인당 스카치 위스키 소비량에 있어 세계 최고를 다툰다는 우리의 음주문화라 할지라도 맑고 시원한 막걸리 또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으니 참 좋다.
나빠진 경기 때문에 싼 것만 찾는다고 시비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연말은 비싼 술과 음식보다는 시원한 술국을 안주 삼아 가까운 이들과 탁주 순배를 돌리면서 정들었던 이야기를 실컷 하면서 보내고 싶다. 단 탁주는 반드시 엄지 손가락을 위로해서 대접을 들어 시원하게 들이키며 그리운 얼굴들과 너털웃음을 나누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