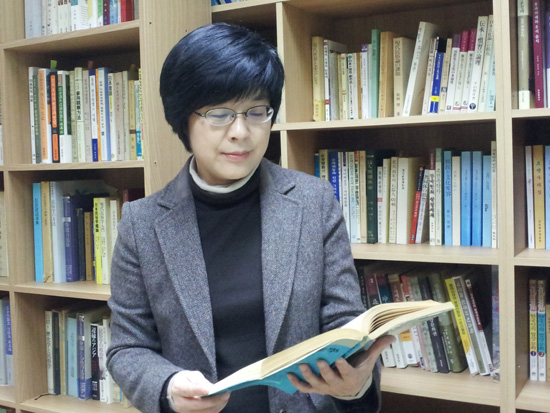|
|
"과감히 제사를 3대 봉사로 줄여야 합니다. 나아가 생전에 낯이 있는 조부모까지로 제사를 줄이거나 기제사를 한번에 치르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사시간도 초저녁으로 당기는 것이 옳습니다.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각자의 형편에 맞춰 지내는 게 오히려 예법에 맞습니다."
설을 앞두고 최근 '조상 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는 책을 낸 한국국학진흥원의 김미영(51ㆍ사진) 책임연구위원을 인터뷰했다.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는 우리나라가 급격히 산업화, 도시화 하면서 명절 때마다 논란이 돼온 주제다.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3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딸 할 것 없이 자손들이 제사를 나눠 지냈고, 성리학이 번성하던 즈음에도 보통 3대 봉사(위로 3대 증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 했다. 이는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나와있는 내용으로, 4대 봉사는 중국에서도 제후의 예법이다. 제사 음식도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10가지를 넘기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제사가 많으면 기제사를 1년에 10번 넘게 지내는데, 이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현재 경북 안동지역에 종가가 50여개 있는데 이중 절반 가량이 3대 봉사로 줄이고, 제사시간도 자정이 아닌 초저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었던 제사 및 상속 방식이 왜 지금처럼 변했을까. 김 연구원은 유교의 성리학적 가족이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위 '대종 (大宗)', 장자 혈통을 중요시하고,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재산과 제사를 자손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보다는, 부계 친족구조 성립을 위해 맏아들에게 몰아줬다. 지배계층에 국한됐던 이러한 경향이 18세기 무렵 일반서민에게로까지 확산돼 장자 중심의 상속과 제사 문화로 뿌리 내리게 됐다는 것.
김 연구원은 "자녀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모시는 '윤회제사' 관습은 17세기 말까지도 당시 민간의 서간문이나 일기 자료에 자주 발견된다"며 "상대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덜 받은 동해안, 서해안, 제주도 등지에서는 아직도 자식들 사이에 제사를 나누는 '제사 분할' 풍속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동의 명문가인 의성 김씨 청계종가에서는 7남매가 재산을 고르게 나누고, 제사도 나눠 모신다. 상속과 제사,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법에도 '조상 제사는 협의 하에 지낸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 제목처럼 제사를 어떻게 모셔야 할 지 고민하는 자손들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에서 제사를 지낼 때 공간이 안 나오면 방위는 어떻게 할까, 맞벌이 부부인데 제사음식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이 너무 불경스러운 건 아닐까 등등.
"이 책의 요지는 현재의 제사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첫째가 상속과 제사를 모두 가져가는 게 한국 고유의 문화적 DNA가 아닙니다. 아파트라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뒤에 병풍 치는 것으로 방위를 갈음하고, 손이 가는 어려운 음식은 사오더라도 그 외의 것들은 집에서 하면 됩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사위나 외손자가 지내면 됩니다. 우리가 잘아는 신사임당 집안 제사도 결국 외손주인 율곡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사든 성묘든 지나치게 편의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우려했다. 사온 제사음식이든 외진 곳의 산소를 가까이 이장하는 추세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고로움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제사는 단순히 조상을 기리고 모시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까지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수고로움도 피하자면 효나 예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가예문(家家禮文)'이라는 말처럼, 집집마다 형편이 다르니 거기에 적절히 맞춰가는 거죠."
산소 이장과 화장에 대해서도 변화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언젠가는 묘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전체 장례의 99%가 화장이고, 국내 납골당이나 추모공원 등도 길어야 50년 계약입니다. 과거 산 속에 쓴 산소 대부분은 자손이 돌보지 않는 묵묘(陳墓)입니다. 안할 말로 살아있는 부모도 방치하는데 조상까지 손이 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