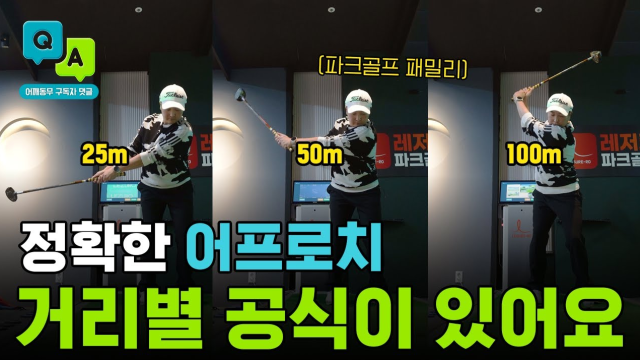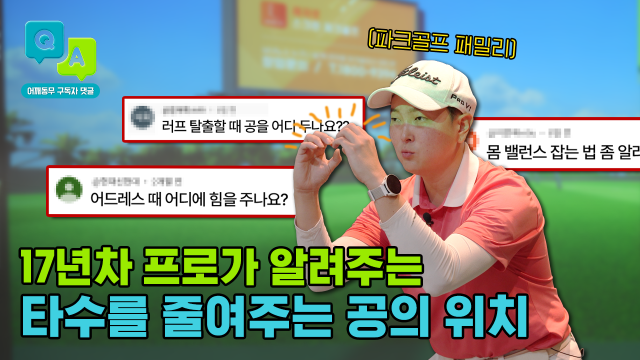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원자력산업은 죽어가고 있어요."
불과 5년 전 일이다. 미국 조지아텍의 부총장은 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원자력공학과 교수였다. 컴퓨터공학 분야는 석ㆍ박사 과정 등록 학생이 수백명에 달하는 반면 원자력공학은 10명에도 못 미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원자력산업의 쇠퇴' 때문이라고 답했다. 원자력산업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조지아텍은 미국에서 주립대 공대로는 최고의 학교로 꼽힌다. 공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산업계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원전기술 실력 갖춰야 운도 따라
미국의 원자력산업은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급속히 쇠퇴했다. 지난 1979년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장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핵연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말았다. 방사선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에 대한 우려는 증폭됐다. 그래서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는 짓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미국뿐만이 아니었다. 그 후 원자력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켰다. 원전 반대 운동이 거세지자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ㆍ일본ㆍ프랑스 등은 꾸준히 원전을 건설했다. 덕분에 원전시장에서는 수급불균형이 일어났다. 구매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면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대가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다.
우리도 이제는 프랑스ㆍ일본 등과 함께 원전 강국으로 통한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다. 우리가 세계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확보한 것은 우선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運)도 무시할 수 없었다. 국운이 따라줬다는 얘기다. 선진국들이 사고 우려로 원전 건설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가 보다 쉽게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일본 업체들이 방심하는 사이 한국의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력을 갖춰야 운도 계속 따라준다. 기술력ㆍ가격경쟁력은 물론 우리에 대한 믿음이 쌓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브랜드 파워가 높아야 한다는 얘기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國格)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다. 인격ㆍ품격 등과 같은 단어를 통해 유추해보면 국가 브랜드와 비슷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브랜드는 고차 방정식이다. 그저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이 좋다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브랜드 가치는 가격 및 품질경쟁력, 디자인 만족도, AS 등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다.
국격도 마찬가지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한다고 해서 국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은 역시 달라" 등과 같은 평가가 나와야 한다. 한국 기업이 만든 자동차나 휴대폰은 국격을 높여주지만 국회에서의 이전투구는 국격을 떨어뜨린다.
국격 높이려면 원칙 지켜야
국격을 높이려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미국 의회는 치열한 찬반 논쟁을 펼치더라도 표결을 통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키는 반면 우리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몸싸움에 매달린다. 충분한 토론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우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다.
사외이사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사외이사들의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 선출 결정까지 백지화하는 일도 벌어진다. 금융당국은 주식도 없으면서 압력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 금융회사의 공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상식 밖의 일이다.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다고 국격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와 함께 '원칙 준수' 등과 같은 소프트파워도 갖춰야 국격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