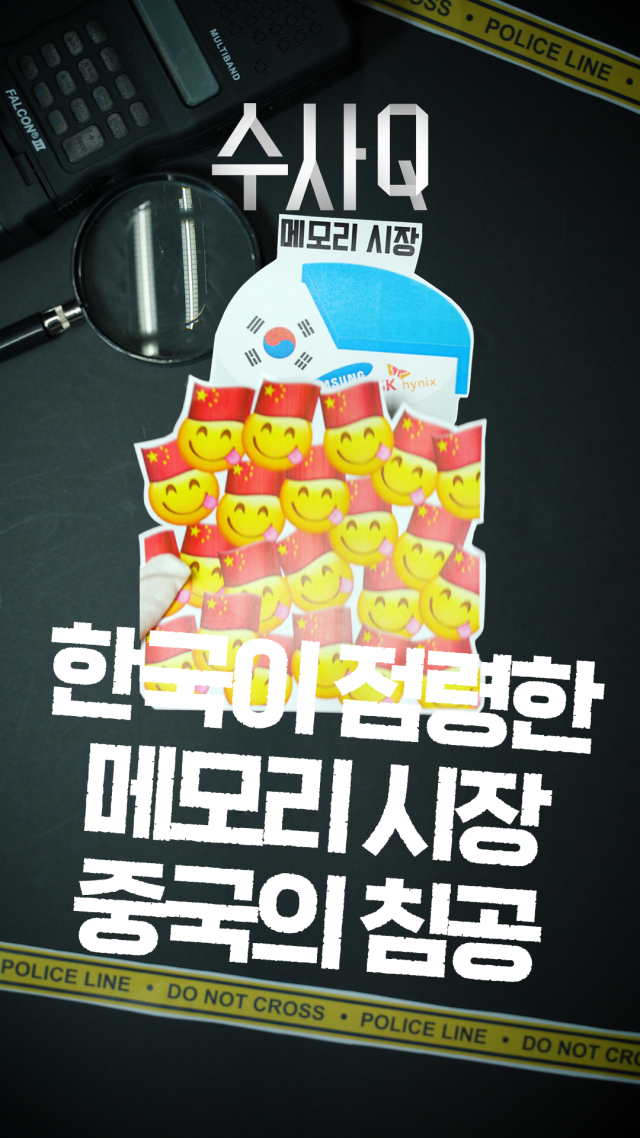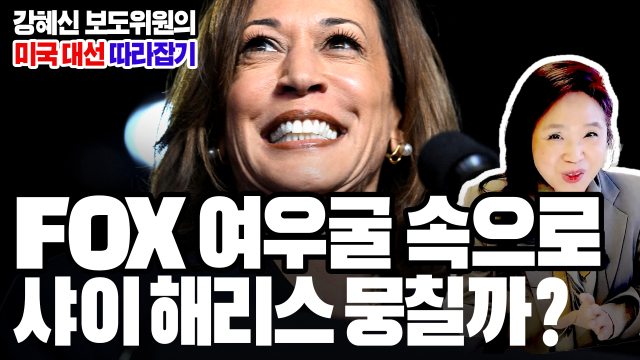|
예술∙체육요원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했거나 문화창달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자격(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등)을 가진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 2년 10개월간 해당 특기분야에 종사하며 병역을 대신하게 한다. 지난 1973년 병역의무특례규제법이 제정되면서 특례보충역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후 세 차례에 걸친 병역법과의 분리∙통합 과정을 반복하다 1995년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술∙체육요원제도로 바뀌어 이어져 오고 있다. 1973년부터 2010년까지 1,338명(예술 548명, 체육 790명)이 편입됐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고는 한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니 선수의 장래를 위해 병역미필 선수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자신의 영광이나 국위선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노라고 인터뷰하는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제 병역면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됐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한정된 체육요원 편입기준의 경우 현행 체육연금 지급방식처럼 세계선수권대회 등 모든 국제대회를 포함, 입상성적에 따른 누적점수제를 적용하고 편입인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의 메달 획득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프로선수 등으로 활동하며 영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예술∙체육요원에게 일정 기간 무료 예술공연, 유소년 지도 등 사회봉사∙공공기여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해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 병무당국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