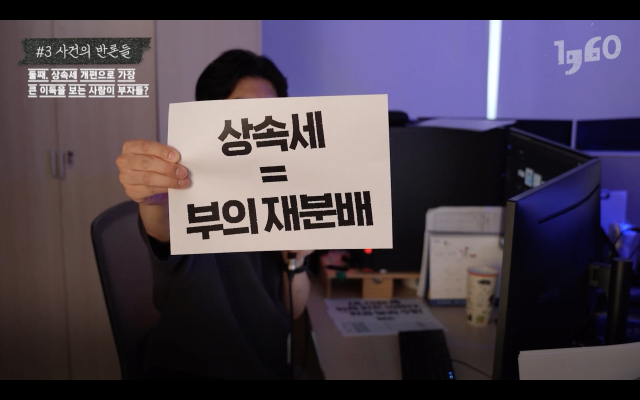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증권사 설립이 유행이다.”
국내 증권사의 한 임원이 최근 기업들의 잇단 증권업 진출을 두고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다. 그는 상당수 비금융권 기업들이 증권업에 대해 돈만 있으면 짧은 기간 안에 쉽게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물론 그의 푸념 뒤에는 기존 플레이어로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시장을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경계심리도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규 또는 인수합병(M&A) 등으로 많은 증권사들이 일시에 등장해 인력구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일이다.
증시를 둘러싼 ‘불안한 유행’은 특히 해외투자 부문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해외진출의 깃발 아래 국내 자금을 모아 베트남 주식ㆍ부동산ㆍ자원개발 등에 투자된 펀드가 적지 않다. 심지어 국내 한 금융투자기관의 경우 베트남에만 무려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집중 투하한 상태다. 최근 베트남 경제가 IMF설에 휩싸이고 있고 증시도 불과 반년 만에 반 토막 난 상황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사장을 역임했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래전 국내 증권사들에 일본진출 붐이 일면서 한때 현지 지점이 20여곳이 넘었는데 지금은 1~2개에 불과하다”며 “금융업의 해외진출은 적극 권장할 일이지만 변수가 많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너무 쉽게 대규모 투자가 결정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투자금융을 신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정부ㆍ업계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미 국내 금융투자사들은 지난해부터 중국은 물론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등지로 경쟁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분석과 장기적인 전략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저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후다닥’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다.
금융투자사들의 해외진출은 결국 국내 투자자들의 돈, 즉 국부(國富)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섣불리 투자했다가 원하지 않는 장기투자자가 되거나 서둘러 철수할 수밖에 없는 ‘냄비투자’의 위험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