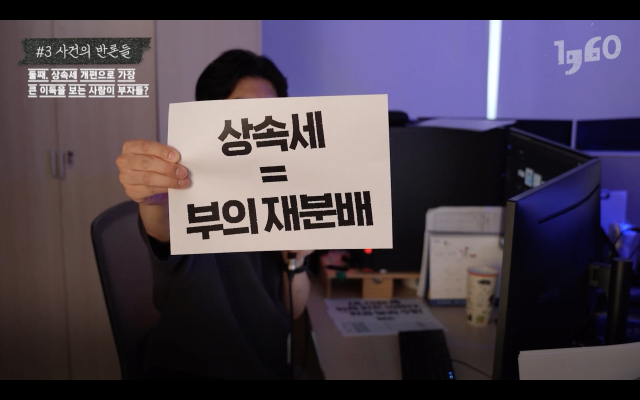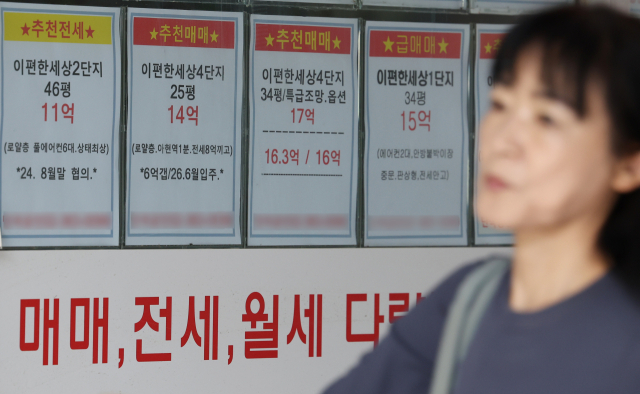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지난 1980~90년대 재벌의 자존심이 프로야구ㆍ축구단 소유라면 2000년대의 그것은 증권사인 것 같다.”
한 증권인의 푸념이다. 증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비슷한 분야에서 치고받으며 그렇지 않아도 좁은 시장을 더욱 혼탁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증권사 8곳이 설립 예비인가를 획득함으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영업하는 증권사가 62개로 늘어난다. 주요 대기업이나 은행 치고 증권사를 보유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됐다. 만약 현대중공업이 CJ투자증권 인수에 성공하면 현대가는 현대증권(현대그룹)과 현대차IB증권(현대차그룹) 등 3곳의 증권사를 소유하게 된다. 재벌이 분리될 경우에도 다른 쪽 업종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진 것이다.
최근 증권사들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증권업은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 등 당분간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자기 업종을 불안해 하고 있는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
그럼 대책은. 브로커리지로는 한계가 있으니 투자은행(IB)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흔한 주장이다. 인수합병(M&A)으로 규모를 키우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따라다닌다.
IB시장은 얼마나 될까. 일반기업 입장에서 보자. 한국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통로에서 은행대출은 426조원으로 기타 증권ㆍ채권시장 등 비은행계 자본시장 62조원의 7배에 가까운 절대액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은행대출 시스템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다. 이는 반대로 IB시장이 여전히 무궁무진함을 가리키기도 한다. 증권사들이 질적ㆍ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IB 부문을 확장해야 하고 그 대상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도 비싼 은행 돈을 빌리지 않고도 안정된 자금을 얻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셈이다.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도 쉽게 들린다. 증권시장에 생사를 건 무한경쟁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