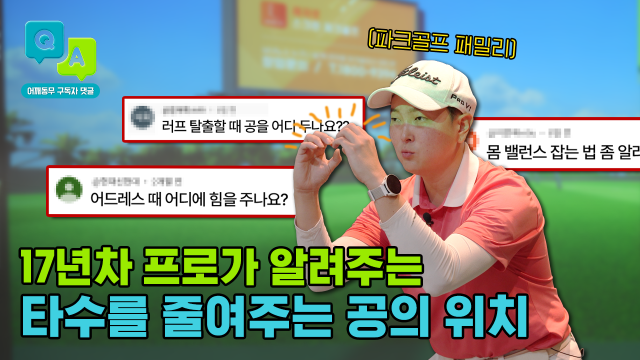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자며 정부가 내놓은 밑그림에 반응은 미지근했다. 주요 기사나 사설로 다룬 언론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지난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에 대한 기사를 한 중앙일간지는 지면 맨 아래 구석에 단신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정부의 밑그림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육·해상 사고시 각각 소방방재청과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현장지휘권을 준다는 게 골자다.
총리가 대형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인데 오버랩되는 과거 장면을 떠올렸다면 새로울 게 없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가 재난대응의 핵심 조직인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겠다고 밝혔던 만큼 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예견됐던데다 그동안 그토록 강조돼왔던 컨트롤타워가 결국 '같은 총리,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컨트롤타워에는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정부가 벤치마킹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지난 2005년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사망·실종자가 2,500여명에 이르는 재앙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안전행정부나 해양경찰청처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구조대원 파견 및 구호활동 지연을 부른 FEMA청장의 오판은 사실 따지고 보면 9.11테러 이후 약화된 FEMA 위상에서 비롯됐다. 카트리나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미 행정부보다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FEMA 리더십 복원이었다.
이번 재난대응 플랜이 미국의 체계와 일부 비슷하지만 확실한 차이는 있다. 독립적 위상을 가진 FEMA청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재난대응 계획수립의 권한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사실상 영향력이 제한적인 총리에게 재난대응 책임을 지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전 총리의 역할과 권한이 사고 후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수많은 인명이 위협 받는 비상시에 컨트롤타워가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더군다나 총지휘자까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그때 그 사람'이라면.
내년 초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 등 넘어야 할 변수가 많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밑그림이 엉성하다면 깨끗이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