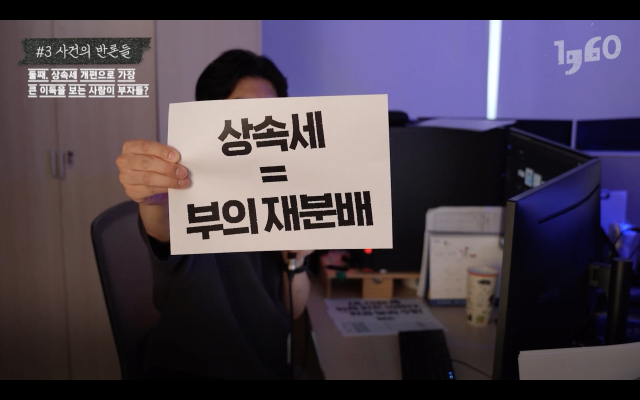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영화 '소셜네트워크'속에 등장하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일갈이다. 페이스북 서비스 초창기 때 상황임을 감안하면 저커버그의 걱정은 십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용자 수가 10억명에 육박하는 2012년에는 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인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특성상 대체 서비스를 찾기 쉽지 않은 탓이다.
가입자 6,0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이 지난달 30일 또 장애를 일으켰다. 카카오 측은 이번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처음에는 이통사 탓을 하더니 지난 2일에는 사과 공지문을 올려 장애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지만 이용자들은 그저 수긍하고 넘어갔다. 몇몇 게시판에는 '공짜로 쓰는 주제에 불만만 많다'라는 누리꾼의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서비스 초창기에 이 같은 장애가 발생했다면 카카오 관계자들은 영화 속 저커버그와 유사한 걱정을 했을 테다. '마이피플' '틱톡' '네이트온톡'과 같은 유사 서비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카톡 하세요'라는 말이 일상처럼 쓰일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문제는 카카오톡이 최근 모바일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발생한
서비스 장애만 벌써 네 차례다. 수익모델 확보에만 주력해 서비스 안정화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카카오 측이 제아무리 서비스를 잘못 운영한다 하더라도 눈에 띄는 가입자 이탈이 몇 달 안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스토리가 '싸이월드' 가입자 수를 추월했듯 인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업체 간 순위 바꿈은 시나브로 진행된다. 항상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침해와 가입자 부풀리기 등의 문제로 시가총액이 반토막난 것 또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듯 보이는 카카오톡의 위기는 오히려 지금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