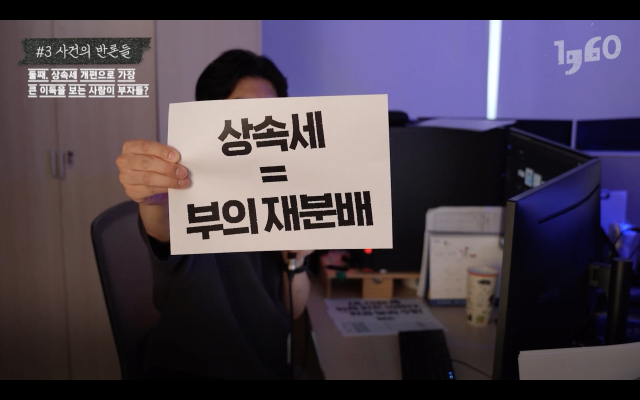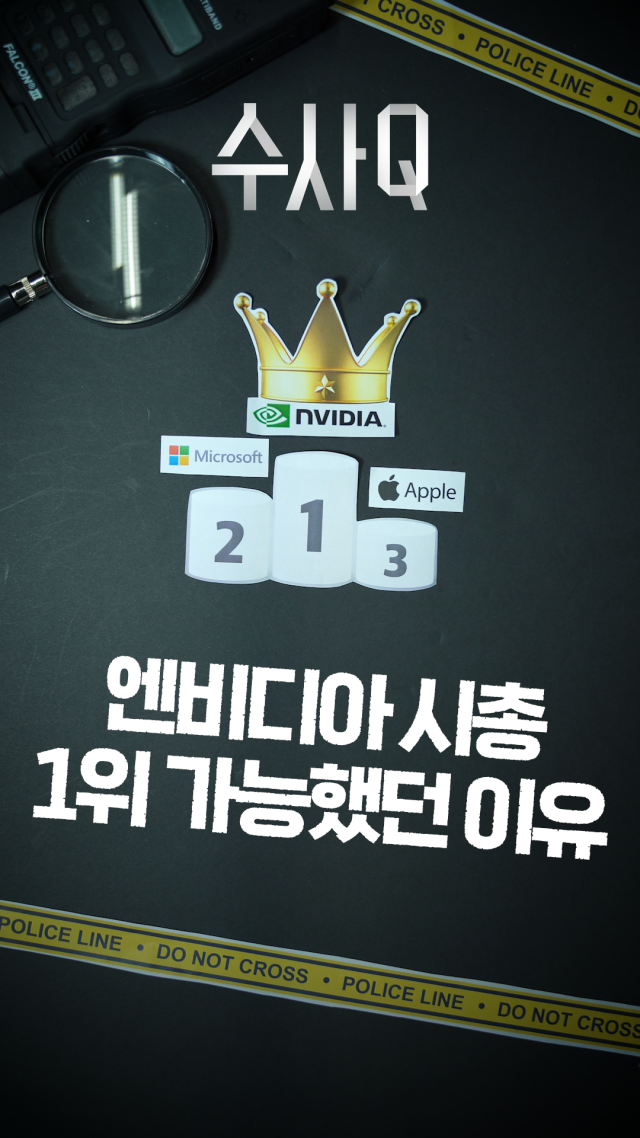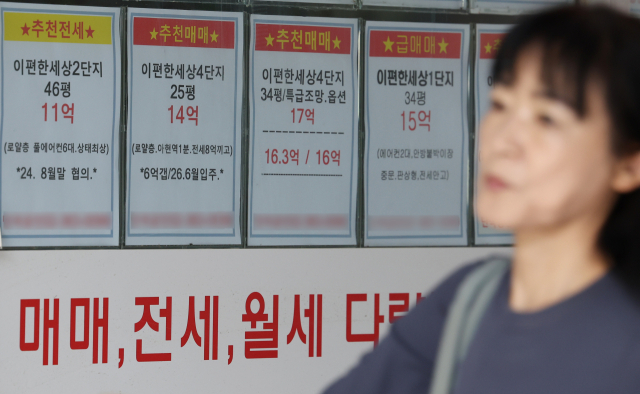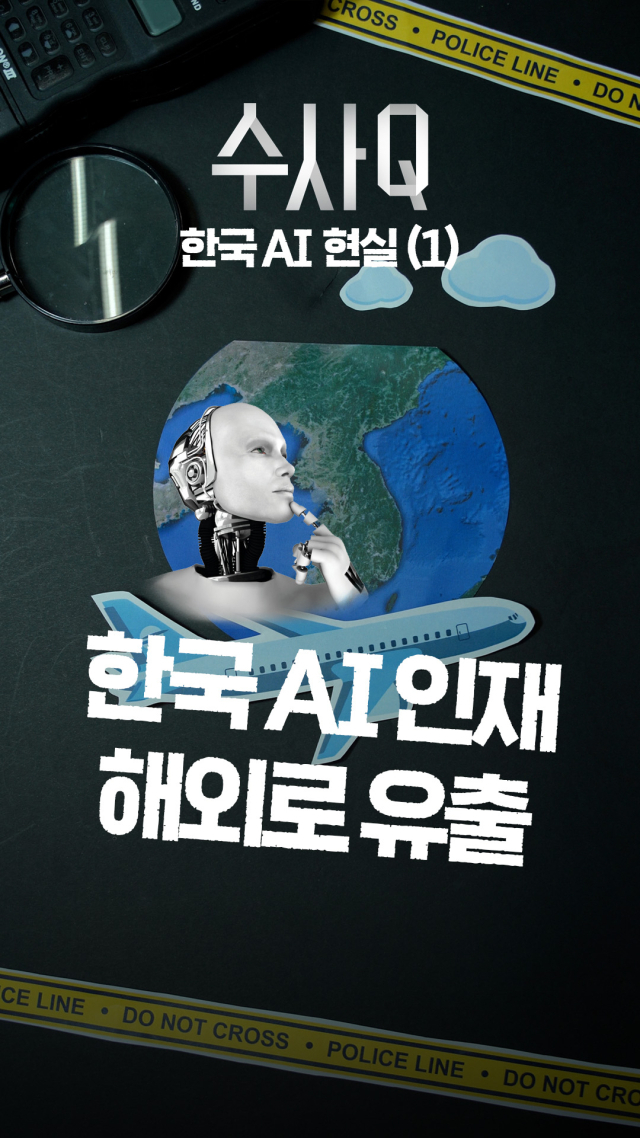아문센-스콧 남극기지, 항공기의 벤투리 효과와 수압식 잭 이용해 쌓이는 눈 최소화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남극에는 세계 각국의 과학기지들이 위치해 있다.
이들 과학기지들이 혹독한 기후를 견디면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연구만이 아니라 기지를 모두 덮어버릴 정도의 눈을 치우는 일이다.
만약 눈 치우기를 포기한다면 기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고립되고 만다.
미국 국립과학재단 산하의 아문센-스콧 남극기지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건설함으로써 눈을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했다.
최첨단 방설기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문센-스콧 남극기지에 적용된 방설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비행기 날개의 공기역학적인 기술을 적용해 쌓이는 눈을 최소화 했다.
항공기 날개에 이용되는 ‘벤투리(venturi) 효과’를 이용함에 따라 바람에 날려 온 눈과 얼음을 기지 위쪽과 아래쪽으로 모두 날려버리도록 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3.5m짜리 높이의 36개 기둥 위에 기지를 세운 것.
각각의 기둥에는 50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수압식 잭을 설치해 기지 전체를 약 7m 높이까지 들어 올림으로써 눈과 얼음이 쌓이는 겨울 동안을 견디게 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약 15년이 지나야만 이 기지 밑으로 눈이 쌓이게 된다.
아문센-스콧 남극기지에 이 같은 설계를 적용한 것은 연평균 강설량이 20cm에 불과한 지역이지만 평균 시속 20km의 바람이 눈과 얼음을 이동시켜 주변지역의 유일한 인공 건축물인 이 기지에 쌓아 놓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난 1956년 처음 건립한 아문센-스콧 남극기지는 지난 1975년 직경 50m 크기의 돔형 기지 건물을 세웠다.
하지만 이 돔형 건물은 계속해서 눈과 얼음 속에 파묻히게 됐고, 이 눈을 치우는 데만 연간 1만6,000갤런의 연료와 1,500인시(man-hour)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에 최첨단 방설기술을 적용한 기지는 아문센-스콧 남극기지의 세 번째 건물로 설계 단계부터 방설에 초점을 뒀다.
각종 과학연구를 위해 극지로 파견된 연구원들이 눈 치우는 일에 바쁘다면 그만한 낭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 건물은 길이 124m에 폭이 45m에 달해 축구장(91m x 48m)보다 크며, 높이는 24m에 달한다.
지난 1997년부터 건축이 시작돼 지난해 초 완공됐으며, 각종 과학 장비들을 들여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이뤄진다.
미 국립과학재단이 1억5,300만 달러를 투자해 건립한 이 기지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3.21km 두께의 남극 얼음 층 위에 세워져야 하고, 이 얼음 층은 매년 10.5m씩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1.8m 높이의 기초 층은 0.15m 두께의 고강도 얼음 층 위에 철제빔을 격자형으로 놓고 이 위에 기둥을 세웠다.
고강도 얼음 층은 천연 얼음이 60%의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48%의 공기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세워진 36개의 기둥위에 2개 층으로 구성된 기지가 세워져 있다.
이 기지에는 여름에는 150명, 겨울에는 50명의 연구원이 상주하게 되며 연구시설 이외에 독서실·운동시설·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아문센-스콧 남극기지의 경우 가장 따듯할 때가 영하 13.6℃, 가장 추울 때가 영하 82.8℃로 연평균 기온이 영하 4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극지방에서는 1일 평균 5,000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섭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주방시설과 샐러드 및 토마토 등의 채소를 키우는 온실도 갖추고 있다.
통상 극지방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연구원들은 고열량 섭취에도 불구하고 평균 6.8kg의 체중감소를 견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