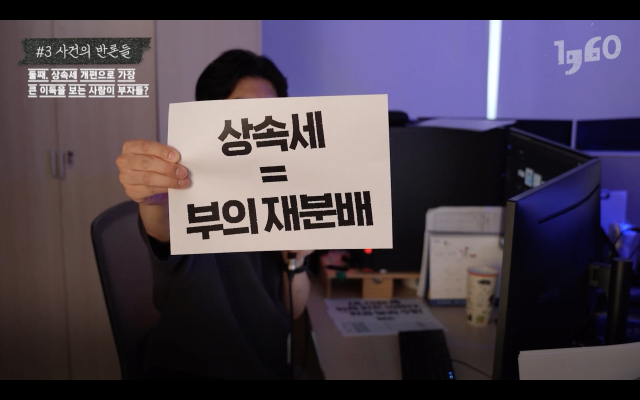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라 어리둥절할 뿐이죠. 솔직히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들고요.”
장류 전문기업인 해찬들이 CJ에 전격 인수된 지 이틀. 해찬들의 한 직원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인이 바뀐 데 대한 당혹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해찬들은 이미 CJ가 합작계약에 따라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인 만큼 나머지 지분 인수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일이었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해찬들 대주주였던 오형근 회장 이하 경영진은 CJ가 합자 당시의 약정을 파기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해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최근 승소 판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마당이었다. CJ 측이 상소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해찬들 내부에서는 “대기업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친다”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었다.
오 회장과 그 형제들이 모든 지분을 CJ에 넘기고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공시가 난 것은 그로부터 불과 십여일 후. 오 회장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퇴임했고 대표이사 역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찬들의 글로벌화를 위해 저력 있는 대기업으로 회사를 넘기게 됐다”는 것이 오 회장의 ‘변(辯)’이었다. 업계에서는 오 회장이 이전부터 운영해온 골프사업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이튿날 해찬들에는 CJ 출신의 신임 사장이 선임됐고 곧이어 팀장급 6명이 새로 부임했다. 기존 직원 4명은 경영체질 개선이라는 ‘애매한’ 타이틀이 걸린 태스크포스팀(TFT)으로 이동됐고 CJ와의 소송 전담 직원 등 3명은 하루 만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주인이 지분을 팔았으니 종업원들은 결정에 따를 뿐이다. 하지만 “승리가 눈앞”이라며 “돌격 앞으로”를 외치던 장군이 남몰래 적군에 군대를 넘겨버린 상황에서 해찬들 직원들의 당혹감과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조직개편도 없다고 하고, 회사가 크려면 대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노력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한 직원은 씁쓸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이같이 말했다.
고 오광성 회장이 52년 설립한 해찬들은 장류 부문으로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고 성장해온 ‘작지만 탄탄한’ 회사다. 새 주인이 남겨진 직원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리며 시너지 효과를 일궈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