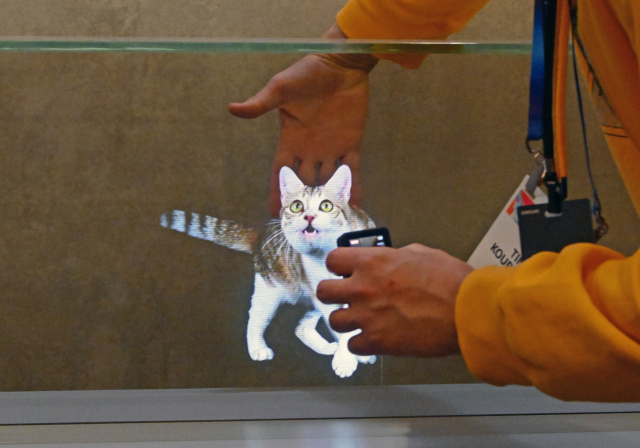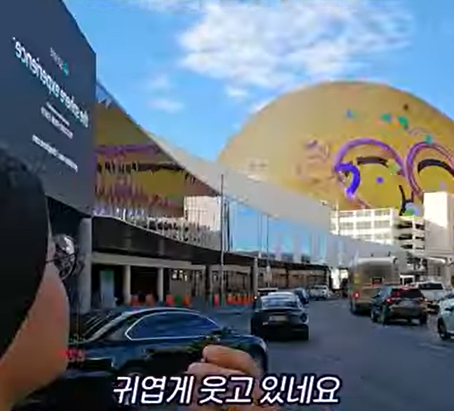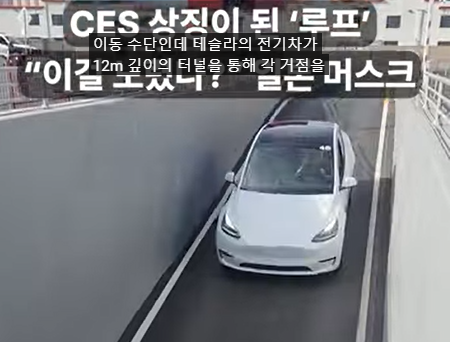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산업연구원(KIET) 보고서는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KIET 조사 결과 지난 1993년 11.08이던 제조업취업계수(10억원어치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력 수)가 2006년에는 3.66명으로 무려 67%나 줄었다.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이 13년 만에 3분의1로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다. 기술과 자본투자 확대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의 노동집약산업 투자가 갈수록 늘어난 탓이 크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다.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고용창출정책이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KIET 보고서는 이런 노력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졌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는 1995년 251만개에서 2005년 180만개로 71만개가 줄었다. 반면 종업원 299명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1,112만개에서 1,335만개로 223만개가 늘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자금지원과 세금감면이 요구된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19.9로 제조업(10.2)의 거의 두 배에 이르지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미국(76.1%), 영국(75.9%) 등 선진국보다 아직도 낮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대로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도장이 770개나 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서비스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과감한 개방과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대기업ㆍ제조업과 함께 중소기업ㆍ서비스 산업도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