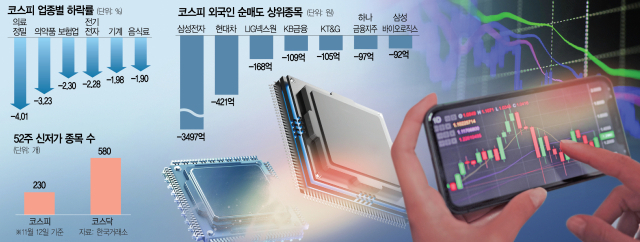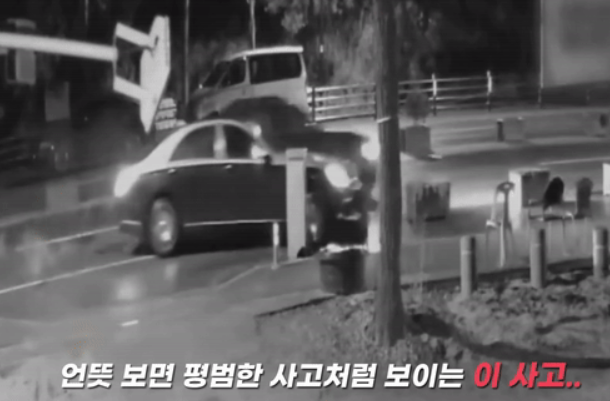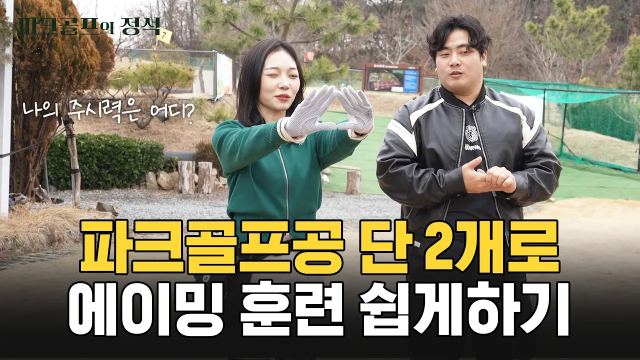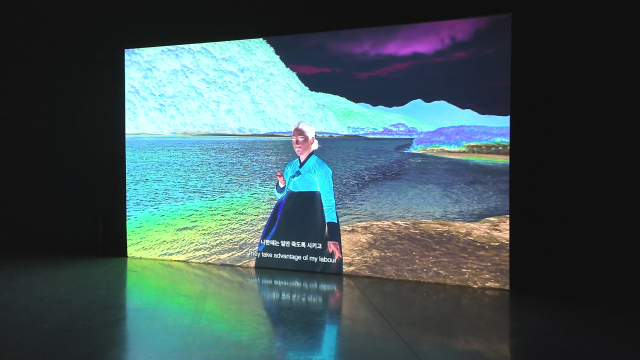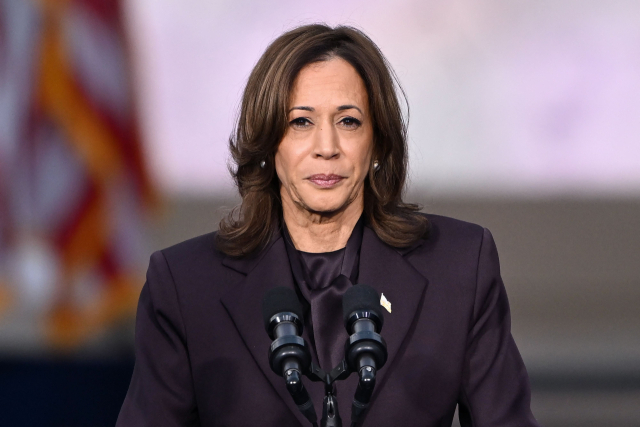양극화 주범은 글로벌화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최종 생산품을 조립하는 소수의 대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적 생산시스템도 분업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이다. 기업 수와 가래가격 등은 시장에 맡겨두면 언제나 최적의 선택이 이뤄진다는 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언제나 왜곡이 발생한다. 시장은 완전경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보다 불완전경쟁일 때가 적지 않다. 여기서 정부개입과 규제의 설 자리가 생기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돼야 한다는 상생 요구가 거세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며 선전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겨냥한 일종의 사회적 촉구이자 정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분위기로 봐서 일시적 바람이 아니라 집권 후반기 들어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친서민정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참여정부의 색깔이 강하게 배어 있는 상생협력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정치사회적인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경제 사정이 크게 좋아지고 일부 대기업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거나 되레 형편이 나빠지는 양극화의 심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와 잘 나가는 소수 간의 대조현상은 마치 대기업들이 경제회복의 과실을 독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대기업이 잘되면 딸려 있는 납품업체들도 당연히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상생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은 한두 가지로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글로벌화가 주된 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뛰는 대기업과 좁은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간에는 매출과 이익 규모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부당행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기업의 이익 가운데 납품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세계를 무대로 가장 값싸고 질 좋은 부품과 소재를 조달하는 글로벌 아웃소싱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국내라고 해서 특별히 가격을 더 쳐주거나 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요소가격이 훨씬 낮은 중국ㆍ인도 등의 중소기업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글로벌시대의 불청객인 셈이다.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가 해법
상생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익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대기업 때리기나 마녀사냥이 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고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쌍방에 이익이 되는 생산적 상생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요에 의하거나 시혜적 상생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스스로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억제하는 독일형 중소기업 풍토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타적 납품구조를 허물고 부품공용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모를 키우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놀라운 성과를 내는 분업을 해치지 않는 생산적 상생의 길을 찾는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