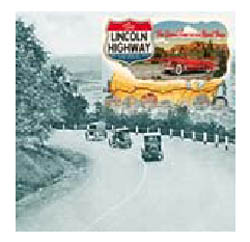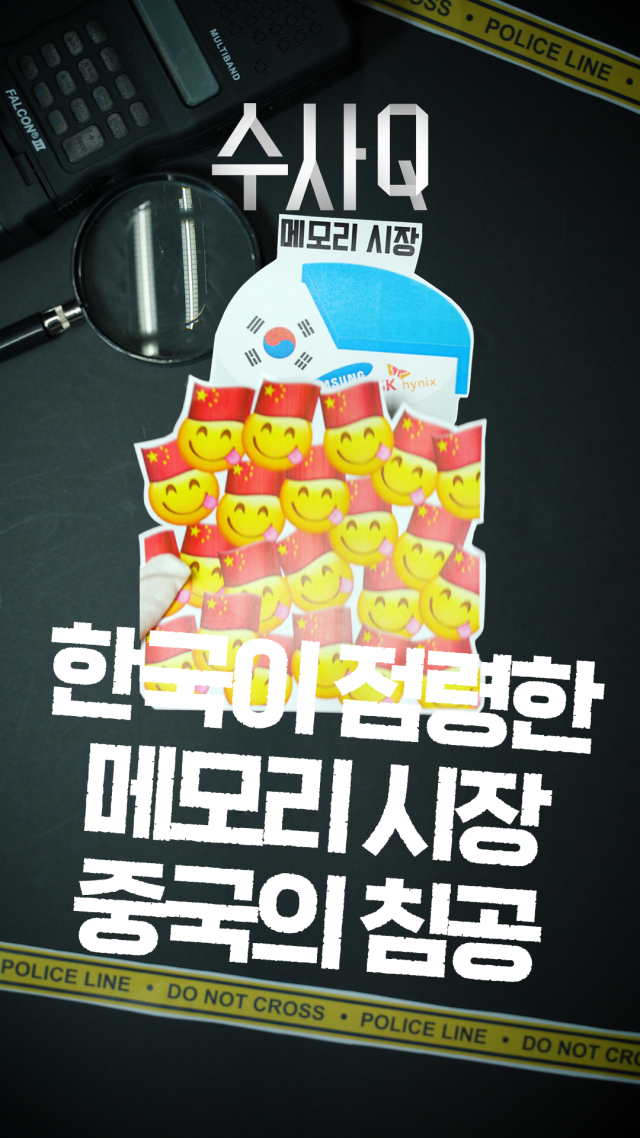|
도로 앞에 번호가 붙는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서도 이름만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링컨 하이웨이다. 1번부터 30ㆍ40ㆍ50ㆍ80ㆍ93번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링컨 하이웨이는 대륙관통도로. 1912년에 처음 거론된 뒤 1913년 10월31일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계획노선은 총 5,454㎞. 오늘날 총연장은 9,445㎞로 늘어났지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철도가 운송망을 지배하고 운하가 보조수단으로 쓰이던 1913년, 통행로를 포함한 ‘길’의 전체 길이는 약 350만㎞였지만 포장도로는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자갈을 섞어 다진 도로조차 8.66%에 불과했던 터라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도로를 건설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들떴다. 도로가 통과하는 12개 주(오늘날은 14개 주) 주요 도시에서 축하행사가 요란하게 열렸지만 문제는 돈. 링컨도로협회(LHA)를 주도한 자동차부품업자 출신 칼 피셔는 모금에 나섰지만 가장 큰 돈을 댈 것으로 기대되던 헨리 포드조차 ‘정부가 할 일’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결국 LHA는 1차 예산으로 책정한 1,000만달러를 갖고 ‘시범구간’ 건설에 나서 ‘폭 33m에 이르는 아스팔트 도로’를 군데군데에 까는 데 그치고 말았다.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공교롭게도 불황. 대공황을 맞아 경기부양을 위해 루스벨트 행정부가 연방예산을 본격 투입한 뒤인 1938년에서야 링컨 하이웨이 계획이 일단락됐다. 미국의 도로망을 일신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링컨 하이웨이는 민간이 선도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창의적 기업인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고속도로망 정비는 훨씬 늦어졌을지도 모른다. 기업가 정신이 나라의 동맥을 태동시킨 셈이다. 부럽다. 경기침체기를 맞은 지금 기업과 정부가 되새겨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