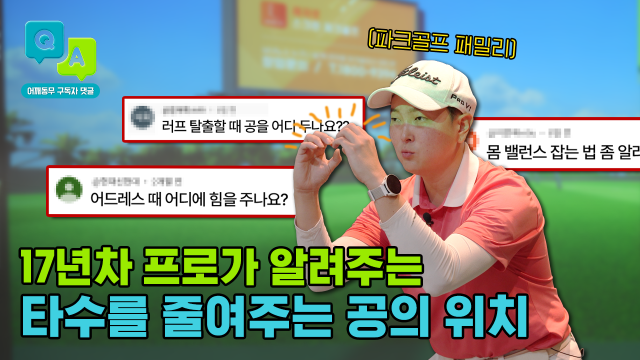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급결제’에 국한돼 진행되면서 마치 ‘꼬리가 몸통 전체를 흔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체의 자통법 공청회에 참석, “자통법의 본질은 상품 이슈에 있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가 주관한 1차 공청회에는 증권업협회와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6명의 패널과 10여명의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 4시간 동안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자통법 공청회라기보다는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놓고 각 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장이었다는 평가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대체 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인지 지급결제 공청회인지 모를 정도로 지나치게 지급결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자통법을 제정,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닦자는 데는 공감함에 불구, 업계의 이권싸움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립은 더 확산되고 있다. 업계의 영역을 넘어 연구단체 그리고 정부기관까지 가세하고 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사실상의 은행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 금융법 체계를 훼손하고 투자은행 발전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지급결제 업무는 결코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닌 만큼 자본시장에 새로운 자금이체 경로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독과점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증권사의 소액 지급결제 기능 허용은 100% 증권금융에 현금으로 100% 위탁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며 “결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여부는 시스템으로 접근해야지 자통법에 끼워넣어서는 안된다”며 “자통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급결제업무는 법안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 시행의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이다. 당초 정치권이나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 내년 하반기 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할 심사였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법안 상정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급결제가 마치 자통법 전체인 양 확산돼 입법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