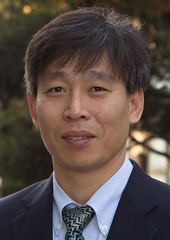|
국내에서도 비만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비만 여부는 몸무게를 키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ㆍ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서양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 35 이상을 고도비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BMI 25 이상을 비만, 30 이상을 고도비만으로 판단하며 남자 3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2010년)이 비만이다. 소아ㆍ소년(2~18세) 비만율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 비만율 10년새 배로
비만은 소득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비만학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낮았다. 소득 상위 25% 소아ㆍ청소년의 비만율은 지난 1998년 6.6%에서 2008년 5.5%로 감소한 반면 소득 하위 25%는 같은 기간 5%에서 9.7%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고소득층은 웰빙 음식과 채소ㆍ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지방함량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햄버거ㆍ라면 등 고열량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분ㆍ염분이 많고 비타민ㆍ미네랄 등 영양소가 적은 고열량 식품 섭취와 교통수단의 발달,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운동 부족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다.
비만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으로 당뇨병ㆍ심혈관질환ㆍ암ㆍ관절염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며 합병증을 제외한 비만 관련 의료비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3.7%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용적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문제다. 비만인 사람들은 알코올성 지방간, 관절염ㆍ당뇨 등 성인병 발병률이 높으며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의료비를 36%나 더 지출한다.
고도비만인 사람들은 약물ㆍ음식조절ㆍ운동만으로는 치료되기 쉽지 않고 BMI 35를 넘으면 수술 외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렵다. 머지않아 다시 체중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고도비만 환자는 위를 잘라내거나 일시적으로 묶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고도비만 환자들은 체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당뇨병ㆍ고혈압ㆍ관절염 등의 질환이 사라지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파르게 비만율이 늘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세계적인 전염병(world epidemic)'이라고 언급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홍보, 건강증진 교육, 소금ㆍ설탕ㆍ지방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한 세금부과, 보건의료 제품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저소득 고도비만 환자 수술 지원 필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고도비만 환자들이 보건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 고도비만 성인의 비율은 4.7%(170만명) 정도이고 절대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할 비율은 0.7%(25만명) 정도이다. 이들 중 우선 저소득 고도비만 환자라도 기준을 설정, 건강을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비만은 비만이 미용적 측면에서 해석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저소득층 비만인구가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