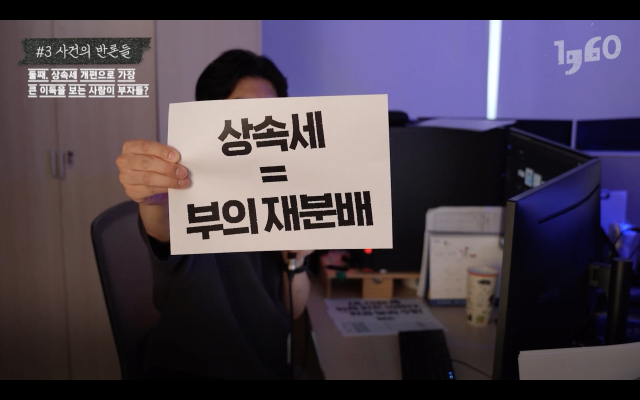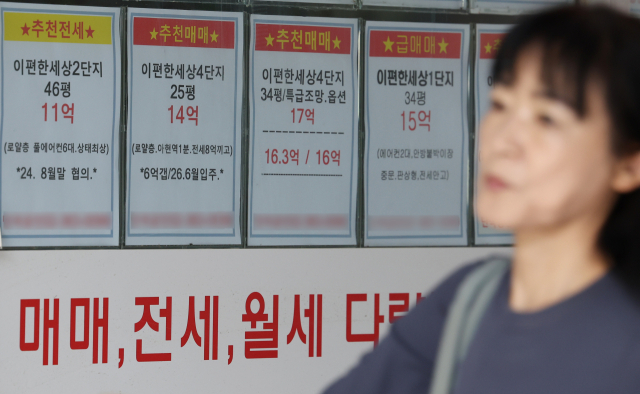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최신 유행하는 옷도 3일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류업체인 신원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장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제품 발주에서부터 생산ㆍ배송ㆍ매장입고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 보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중국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때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유행처럼 진출한 중국 시장은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에 진출한 중견의류업체의 한 관계자는 “요즘 중국에서 한국 패션업체는 ‘봉’으로 통한다”며 “예를 들면 옷 1만벌의 납품가격을 3억원으로 합의해놓고 정작 납기일에는 옷을 내주지 않아 결국 촉박한 생산일정에 쫓긴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주고 제품을 찾아오는 일도 벌어진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시행된 ‘신노동법’에 따라 인건비가 대폭 오른데다 위안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생산지를 적극 물색하고 있는데 결국 최종 답안은 개성공단으로 귀결된다. 베트남이나 인도 등 물망에 오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언제든지 생산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위험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성공단 만한 곳은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지난 2005년 가장 먼저 개성공단에 진출한 신원은 북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악재가 터져도 공장은 단 한차례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개성 공장을 가동한 인디에프는 중국보다 80%나 많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톰보이도 내년부터 개성공단 생산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지난달 말 평양에서 한 남북한 최초의 합영회사 ‘평양대마방직’ 준공식도 패션 업계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준공식이 경색되고 있는 남북경협에 훈풍이 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 의류업체의 관계자는 “이렇게 남북경협이 조금씩이나마 발전하다 보면 개성공단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게 돼 국내 패션 산업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루빨리 그의 기대가 희망사항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