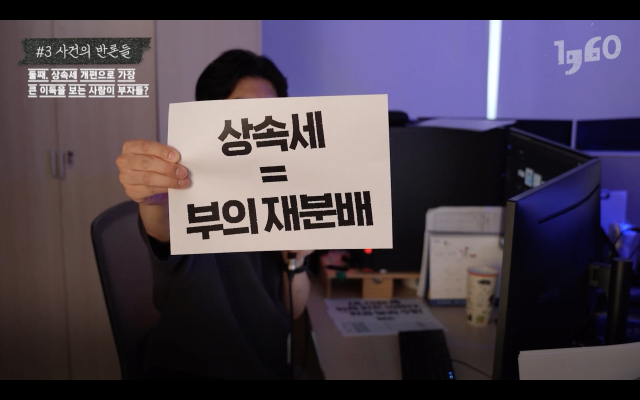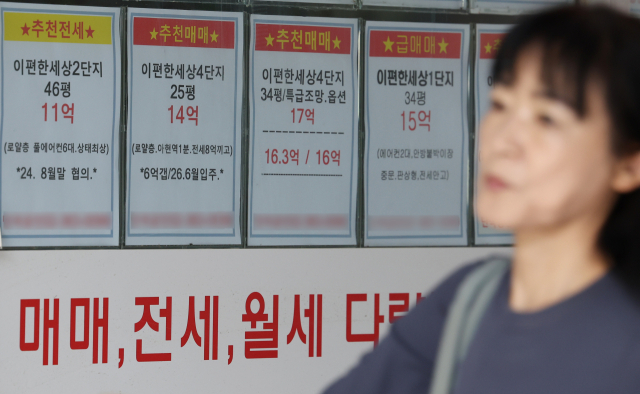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얼마나 투자할 건데요.”
“2007년까지 ○조원이요.”
“S그룹은 2006년까지 ○○조원 투자한다고 하던데요. 그 정도 액수로 청와대에 성의 표시가 될까요.”
“그럼 우리도 1조원 정도 더 늘려 ○조원 투자한다고 써주세요. 나중에 경영환경이 나빠져서 계획만큼 투자 못 했다고 변명하면 되죠, 뭐.”
지난 2004년 5월께 기자가 한 대기업 홍보실에 전화했을 때 보였던 코미디 같은 반응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대표단의 회동 직후 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다짐했다.
2003년 6월 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의 삼계탕집 회동, 2006년6월 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간 별도 만남, 같은 해 12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보고회 등 숱한 모임에서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내막은 정반대였다. 참여정부 내내 재계는 ‘자본의 파업’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애초부터 청와대와의 약속은 의례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했던 것이다.
요즘도 기업들은 입만 열면 ‘투자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친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화답해 30대 그룹들이 지난해보다 19%나 많은 90조원을 시설투자에 쏟아붓겠다고 한다. 성장잠재력 후퇴가 우려되는 마당에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박수를 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한 투자 약속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들에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를 늘리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규제만 완화해주면 투자가 늘어날 것처럼 호도해서는 곤란하다. 투자 부진의 근본 이유도 마땅한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반기업정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와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피해가서는 안 된다. ‘투자 확대’라는 약속어음을 남발하기에 앞서 투명경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 완화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재계도 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