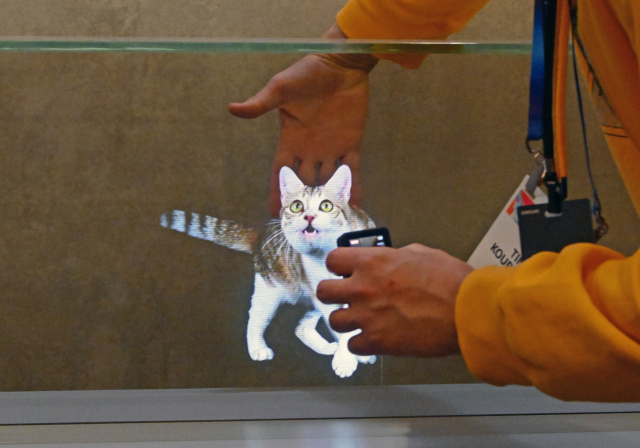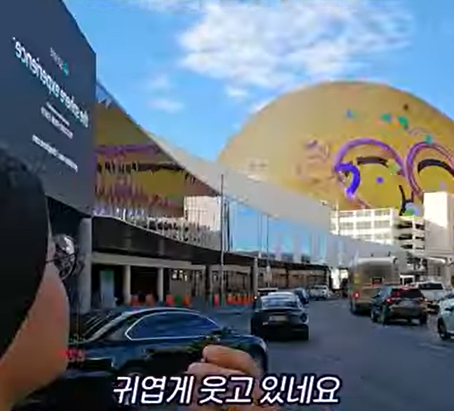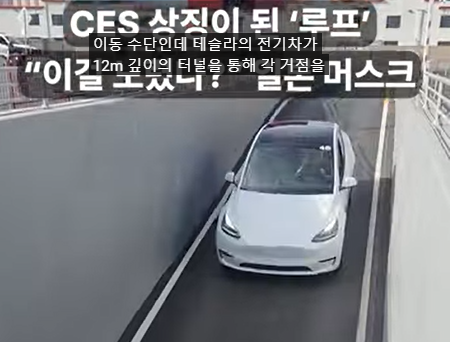한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청년실업률로 정의한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실업률은 올 1~5월에 무려 16.9%에 달했다. 90년 9.0%, 95년 6.3%, 97년 7.7%였던 것이 IMF체제에 들어선 지난해에는 15.9%로 껑충 뛰었으며 금년에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청년실업률 17%대는 같은기간 전체실업률 7.8%, 25세 이상 실업률 6.8%와 비교할 때 두배를 넘어선 수치다. OECD각국과 대비해서는 미국의 10.4%, 영국의 12.3%, 캐나다 15.2%(이상 98년), 일본의 6.7%(97년)를 웃돈다. 미국이나 유럽 청년들이 애써 직장갖기를 기피하는 「직장기피 신드롬(증후군)」에 젖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 청년들의 실업률은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이다.
청년실업률의 이같은 급증은 우선 청년층의 신규취업률이 크게 떨어진 탓에 있다. 또 가장의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집안의 10대 청소년들이 부모를 돕기 위해 대거 구직활동에 나선 것도 한 요인이다. 문제는 이처럼 높아진 실업률이 다시 내려가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있다. 자칫 고실업률이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시, 생산활동의 고용창출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90년의 경우 연간 10억원(95년가격 기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는 69명이 필요했지만 97~98년에는 50명으로 줄었고 올들어서는 48.9명으로 낮아졌다. 앞으로는 한층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다.
결국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창업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가 그 전제다. 정부의 지원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탄력근로시간제 도입도 하나의 방편이다. 여성이라던가 청년층을 시간제 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생각해 볼 일이다. 나라의 동량(棟樑)이 될 청년층을 허송세월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