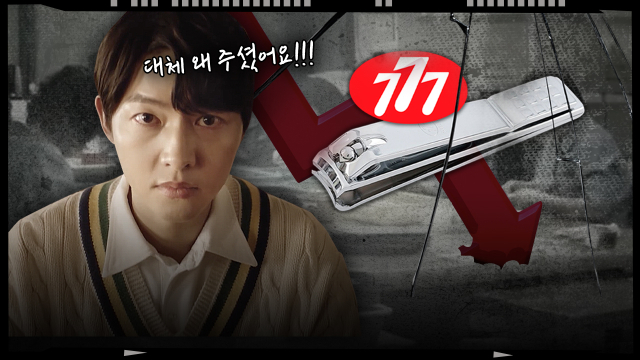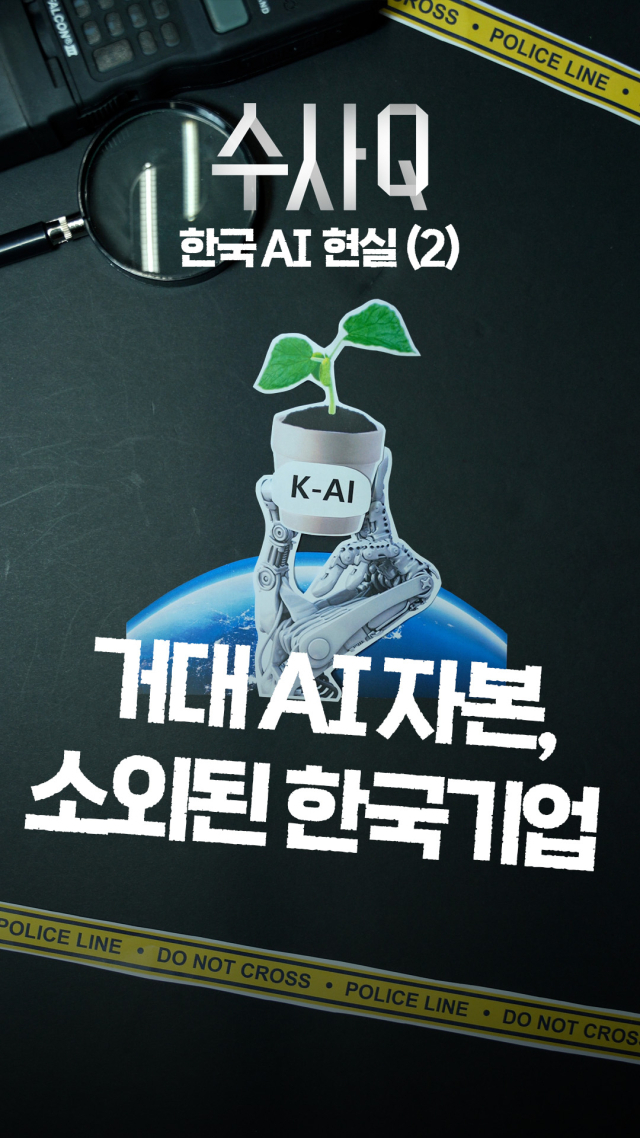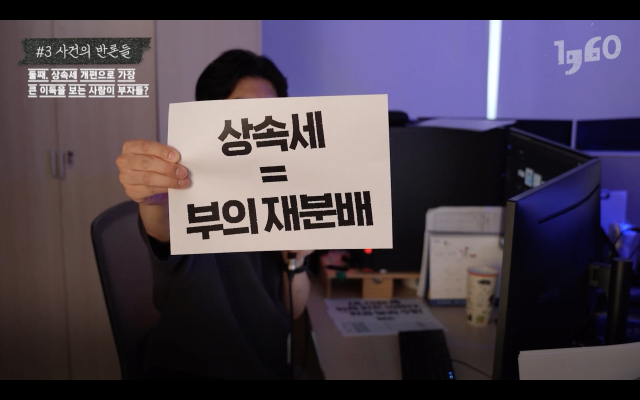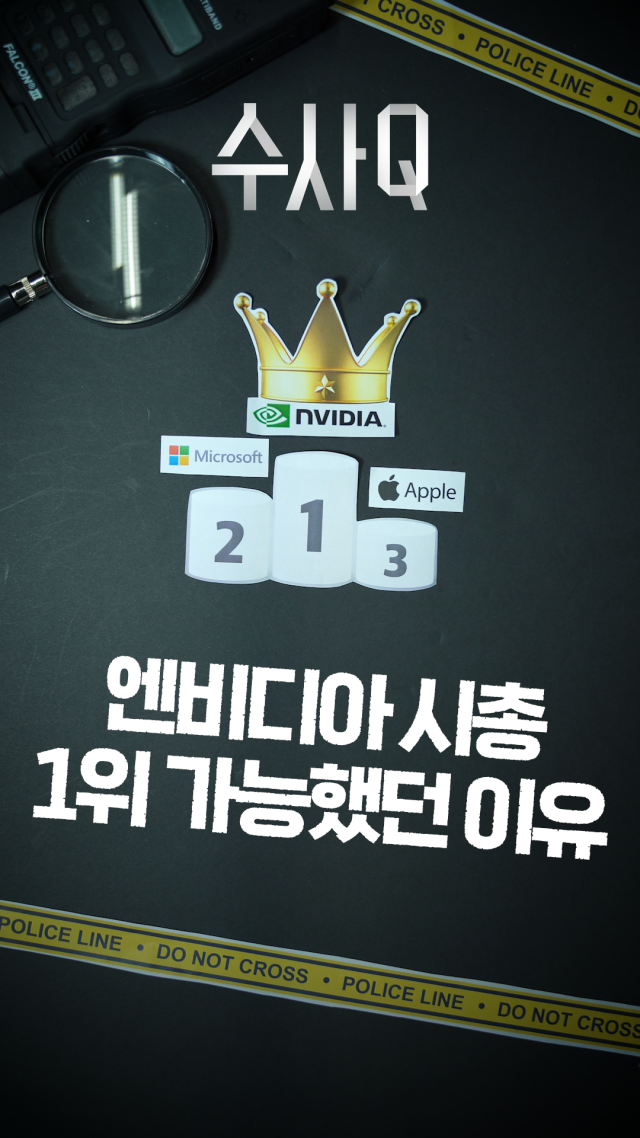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표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후 주석은 시종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 옆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방 미소를 지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이 웃음을 보이지 않은 것은 쓰촨 대지진으로 수만명이 사망해 애도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인 해석이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28일 같은 장소에서 후 주석은 우보슝(吳伯雄) 대만 국민당 주석과 영수회담을 가지면서 내내 환하게 웃었다. 하루 만에 애도기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의 표정은 전날과 크게 달라 보였다.
국가원수의 표정을 놓고 외교관계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 후 주석의 얼굴이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이 조금은 이해된다.
정상회담 당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친강(秦剛)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 ‘냉전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가볍게 입을 놀리는 자리가 아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첫날 대변인의 발언은 한미관계에 중국이 뭔가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마 중국 정부로서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자세를 취하려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미국에 보다 가깝게 다가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 북한도 핵무기 협상을 진행하면서 관련자료를 미국에 먼저 보내 중국으로서는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대만의 우 주석을 대우하는 중국의 태도는 애틋했다. 중국 공산당 대만 판공실 천윈린(陳雲林) 주임은 우 주석과 만나 “양안 동포가 바라던 봄날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4대 방송이 두 주석의 회동을 생중계하고 중국 정부도 그를 국가원수급으로 극진하게 예우했다고 한다. 1949년 국공 내전이 종결되고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건너간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대표가 만난 것이 처음이라는 점도 중국 정부 고위층의 반가움을 자아냈을 것이다.
사실 대만 문제와 한반도 분단은 모두 냉전의 유물이다.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건너가 독자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이 대만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때 수십만명의 중공군이 한반도에 밀려 내려와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대만 주석의 중국 방문만큼이나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한국과 대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은 독립국이고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대만은 중국 내 한 지방정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상회담 또는 영수회담을 전후한 후 주석의 표정이나 대변인격 인물의 논평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하루 사이 중국 지도부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면서 뭔가 찜찜한 마음이 남는다. 중국이 경제ㆍ군사적으로 대국화하면서 과거의 중화주의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봉건시대 중국의 대외관은 중원의 한족(漢族)이 천하의 중심에서 동이ㆍ서융ㆍ남만ㆍ북적 네 오랑캐를 지배하는 이른바 화이(華夷) 사상을 골격으로 한다. 중국의 천자에 복속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공해 복속시키는 관계다.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인들 사이에 중화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후 주석의 상이한 표정이 재래의 관념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냉전시대보다 더 거꾸로 시계를 돌려 봉건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수천년 동안 중국과 접촉해왔다. 때로는 복속했고 때로는 싸웠다. 지금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국가의 자존심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후 주석이 올 봄에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는 일본에 나들이 가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은 일본의 국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