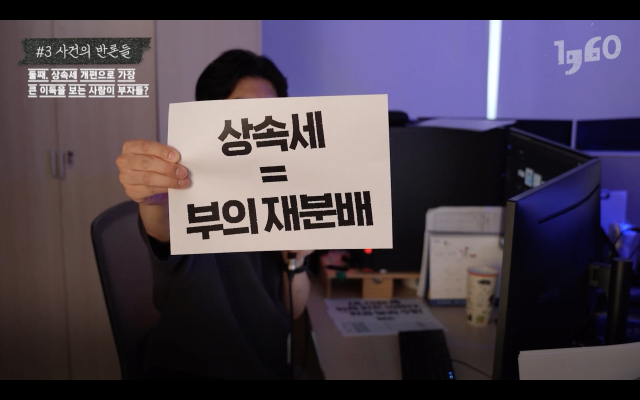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자금지원에 나선다. 우선 신규 선박수주를 돕기 위해 선박건조 지연 또는 조선업체 파산시 선주의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선수금환급보증금에 5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외에 무역보험공사까지 끌어들였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실사 결과에 따른 직접지원 규모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최대 10조원의 신규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19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 때 투입한 공적자금 2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13조원에 달하는 혈세 투입이다. 밑 빠진 독이 따로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비극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된 기업 구조조정 외면의 대가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12년 말 소위 '회사채 대란설'이 퍼지면서부터였지만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너도나도 손을 놓고 있었다. 동양 사태가 터지자 마지못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다. 조선업 침체로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치권의 압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에 또 손이 묶였다. 이러는 사이 기업에 대한 맹목적 자금지원은 계속됐고 그 결과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비중이 최근 5년 새 24.7%에서 34.9%까지 껑충 뛰기도 했다. 말뿐인 구조조정이 결국 혈세 낭비와 부실기업 양산을 가져온 주범이다.
정부는 최근 금융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고용유발 효과에 집착한다면 부실기업 정리 구호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밖에 없고 자칫 자금순환의 왜곡을 가져와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대마'도 부실하면 솎아낼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진행해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숙명의 과제다.
대우조선해양의 비극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된 기업 구조조정 외면의 대가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12년 말 소위 '회사채 대란설'이 퍼지면서부터였지만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너도나도 손을 놓고 있었다. 동양 사태가 터지자 마지못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다. 조선업 침체로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치권의 압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에 또 손이 묶였다. 이러는 사이 기업에 대한 맹목적 자금지원은 계속됐고 그 결과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비중이 최근 5년 새 24.7%에서 34.9%까지 껑충 뛰기도 했다. 말뿐인 구조조정이 결국 혈세 낭비와 부실기업 양산을 가져온 주범이다.
정부는 최근 금융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고용유발 효과에 집착한다면 부실기업 정리 구호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밖에 없고 자칫 자금순환의 왜곡을 가져와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대마'도 부실하면 솎아낼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진행해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숙명의 과제다.